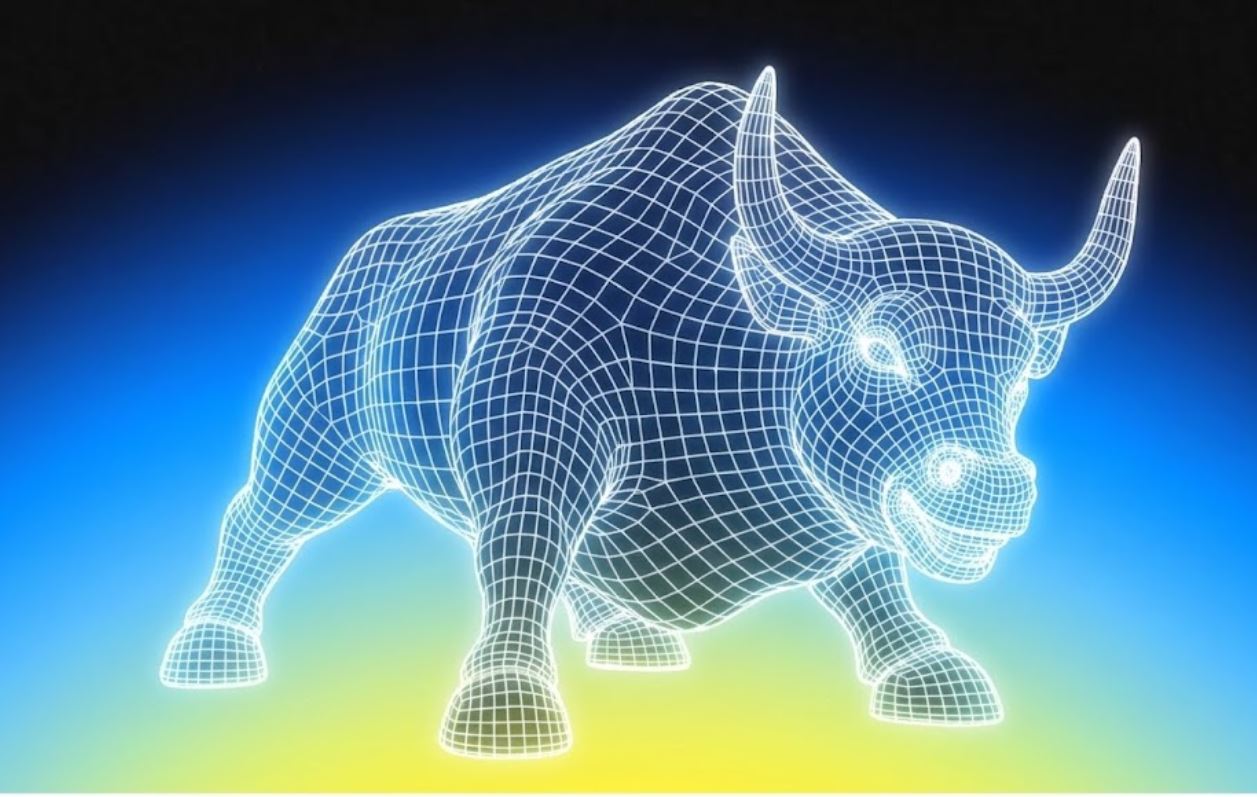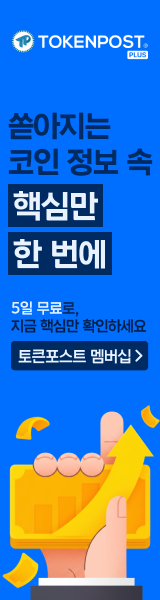북한과의 외교적 교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을 북미 관계 복원의 실질적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거 유해 송환을 계기로 협력이 이뤄진 사례를 바탕으로, 유해 발굴이 인도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해빙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8월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소통 채널 재개를 위한 수단으로 유해 발굴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유해 발굴이 단순한 인도적 이슈를 넘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 관계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의 외교 접점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이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과의 사례를 통해 입증해 왔다고 덧붙였다.
북미 관계에서 유해 송환이 외교적 접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수습에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북측이 유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실질적 조치가 있었다. 이후 이 유해 상자에서 추출된 250명의 유해 중 102명은 미군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약 90명은 한국군으로 추정돼 한국 정부에 송환되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유해 발굴 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DPAA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인도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경제 갈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해 송환 사안은 별도로 취급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중국 랴오닝성에서 한국전 전투기 추락 지점 유해 발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해 감식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진전도 이뤄지고 있다. DPAA는 최근 생물학적 유전자 기술인 단일염기다형성(SNP)을 도입해, 손상된 DNA를 기반으로도 효율적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북한이 협조만 한다면 수년간 중단됐던 유해 발굴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8월 7일부터 이틀간 알링턴에서 열리는 연례 유해 발굴 보고회에는 한국전과 냉전 시기 미군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한다.
이 같은 흐름은 외교적 타협점이 찾기 어려운 북미 관계에서 유해 송환과 같은 인도적 협력이 접점을 찾는 실질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 측 제안에 어떻게 응할지에 따라, 양국 간의 물밑 외교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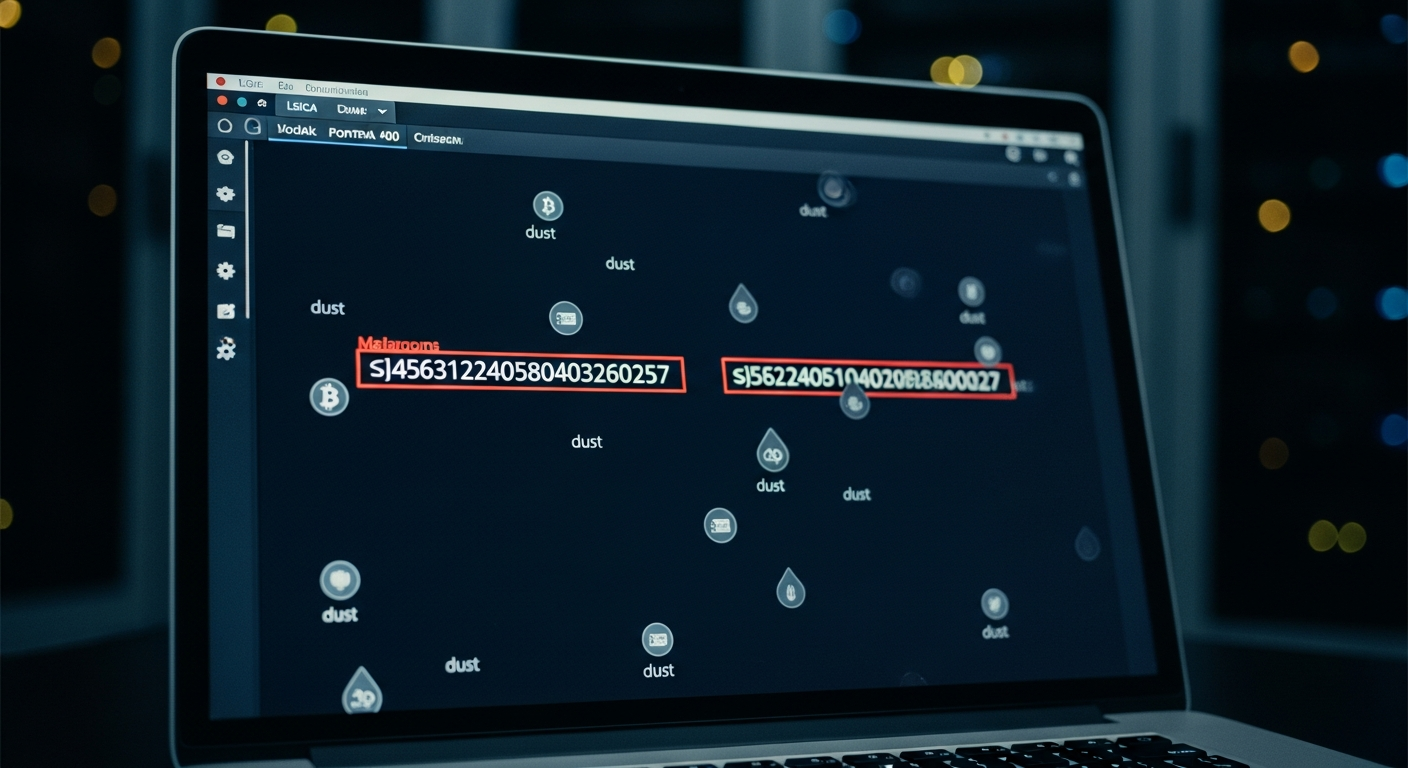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3zpnuqh8q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h11k1htgn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etvwueue8.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xki8fbsgk.webp)


![[시장분석]](https://f1.tokenpost.kr/2026/02/e2wfj5ckgp.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