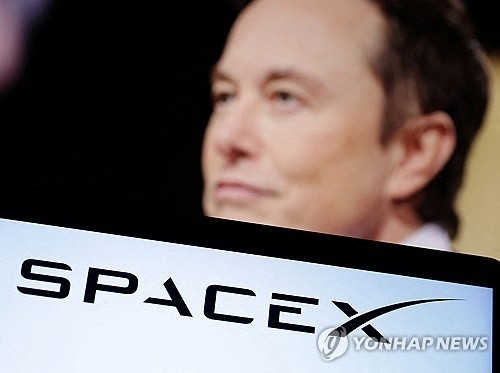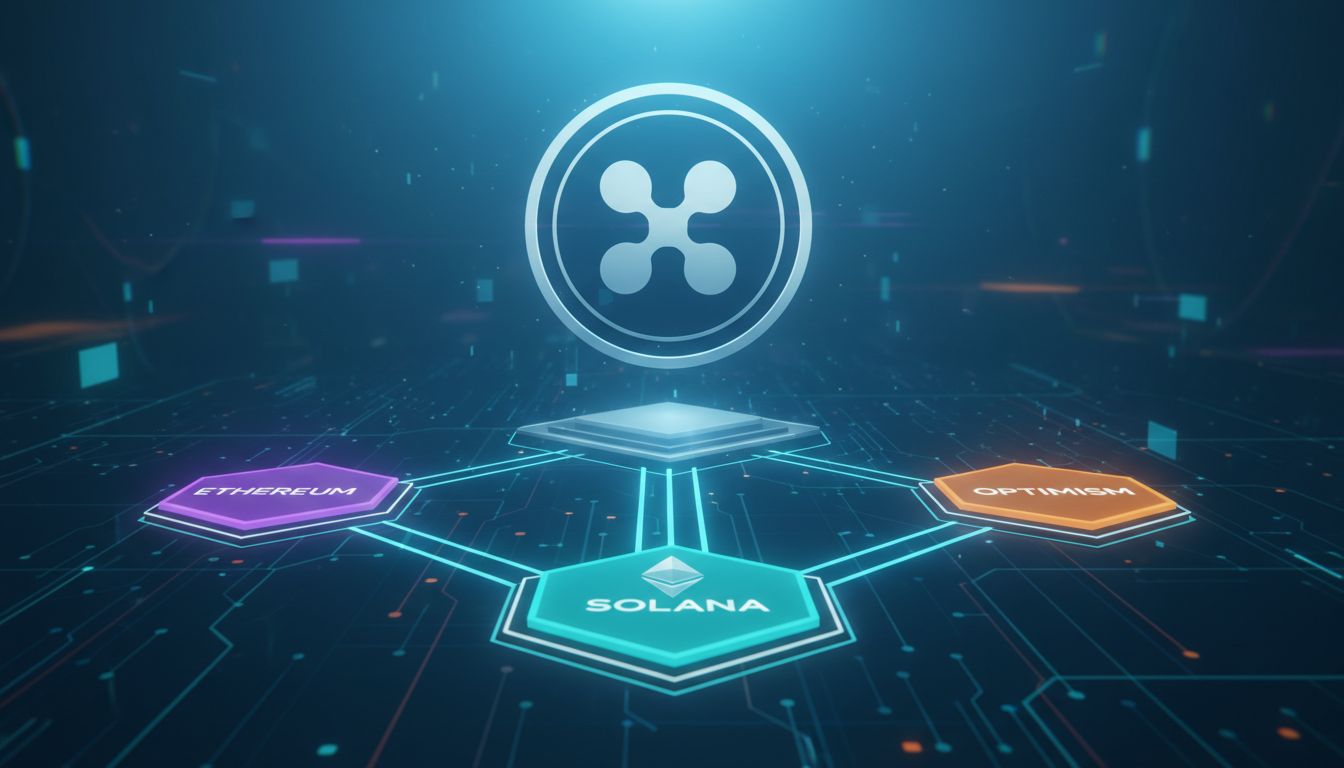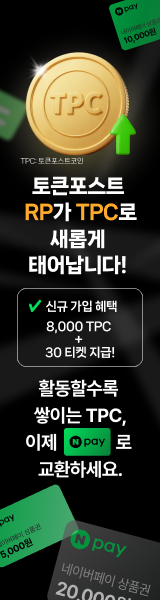금 기반 디파(DeFi) 상품의 구조적 결함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테더골드(Tether Gold)는 8억 달러(약 1조 1,1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팍소스골드(Paxos Gold)도 이에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1% 미만으로, 전통 금융 시장에서 같은 자산으로 얻는 3~5%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친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 투자에 대한 '혁신'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수익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디파가 지향했던 금융 민주화는 금 투자에만큼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단기 유입을 유도하려는 미완성 상품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100년 이상 이어져온 전통 전략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토큰 발행을 수익 창출로 위장한 구조다. 대부분의 금 연동 디파 프로토콜은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저 토큰을 새로 찍어낸다. 연 10% 이상의 유혹적인 수익률도 결국 '에미션'(emission), 즉 신규 토큰 공급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가격 하락이나 발행 중단 시 모멘텀을 잃고, 수익률은 사실상 '제로'로 전락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참여자에게 보상을 돌려주는 폰지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왜곡은 디파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운 유동성 확보 뒤, 정작 수익원이 불분명하자 수익률이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이어진다. 기존 사용자들의 보유 토큰 가치를 희석시키며 장기 가치를 잠식하는 구조가 문제다.
또 다른 근본적 한계는 불필요한 복잡성이다. 금 투자자는 단순히 금 가격에 연동된 수익을 원하지만, 디파 환경에선 복잡한 유동성 풀과 쌍 매매(pair trading)에 끼어 들어야 한다. 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자동 매도 시스템으로 인해 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는 투자자가 원래 지향했던 수익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 효율성도 떨어진다. 유동성 풀 구조는 투자금 절반을 스테이블코인에 묶게 해 실제 금 노출이 약화되고, 수익률은 스테이블코인을 따로 들고 있는 것만도 못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현재 디파는 전통 금융의 상품 설계와 전략을 사실상 복제조차 하지 못하는 인프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에서 금이 상승할 경우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 전략을 병행하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정작 이런 전략을 자동화하는 것에 디파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전통 금융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디파 사용자들은 심화되는 보상 희석과 복잡한 구조에 발목 잡혀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일부 신생 프로토콜은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 중이다. 토큰을 찍어내는 대신, 시장 중립형 차익 거래 전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그 예다. 이러한 모델은 기관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되, 개인 투자자도 단 1,000달러(약 139만 원)와 지갑만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
핵심은 단순함이다. 새로운 디파 모델은 필요 없는 복잡성을 줄이고, 금 투자자의 자산 노출을 보존하는 '단면 스테이킹'(single-sided staking) 구조를 도입해 더 효율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사실 토큰화된 금이 수십 년 된 물리적 금 전략에 밀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태계가 총 예치금(TVL) 확대만을 우선시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보다는 빠른 시장 진입을 급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금 디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프로토콜이 TVL 확보에만 집중하고, 실제 수익 창출 인프라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것보다, 기관 수준의 거래 인프라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러나 시장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 '실제 수익(real yield)'과 단순한 보상 시스템의 차이를 인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정량적 수익보다 실질적 가치 생성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제는 실제 수익 중심의 모델이 디파 도입의 다음 국면을 이끌어낼 것이다. 특히 규제 압력에 시달리는 전통 금융과 대안을 모색 중인 기관 투자자들이 투명성과 수익률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파를 주목하고 있다. 금은 이미 그 완벽한 시험장이 됐으며, 자산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차익 거래 기회 모두 충분하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누가 먼저 디파의 원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황금의 시대에는, 진짜 금맥이 디파에서 터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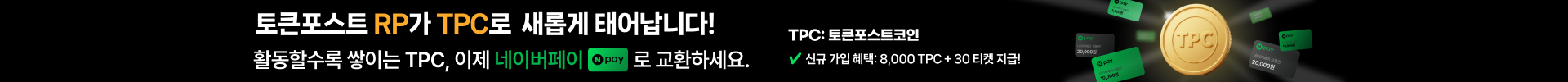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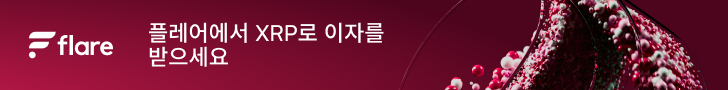







 0
0



![[사설] 월가의 비트코인 행렬, ‘화폐 대전환’의 서막](https://f1.tokenpost.kr/2025/12/hvsrbvvk6v.jpg)





![[코인 TOP 10 주간동향] 룸바드·시아코인 등 BTC 마켓 강세... 슈미어·맨틀도 단기 상승 주도](https://f1.tokenpost.kr/2025/12/zwmzzpu6gd.jpg)


![[오후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 비트코인 9만 달러, 이더리움 3,100달러](https://f1.tokenpost.kr/2025/12/g2ulp0inlk.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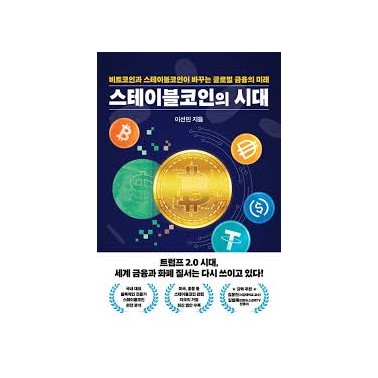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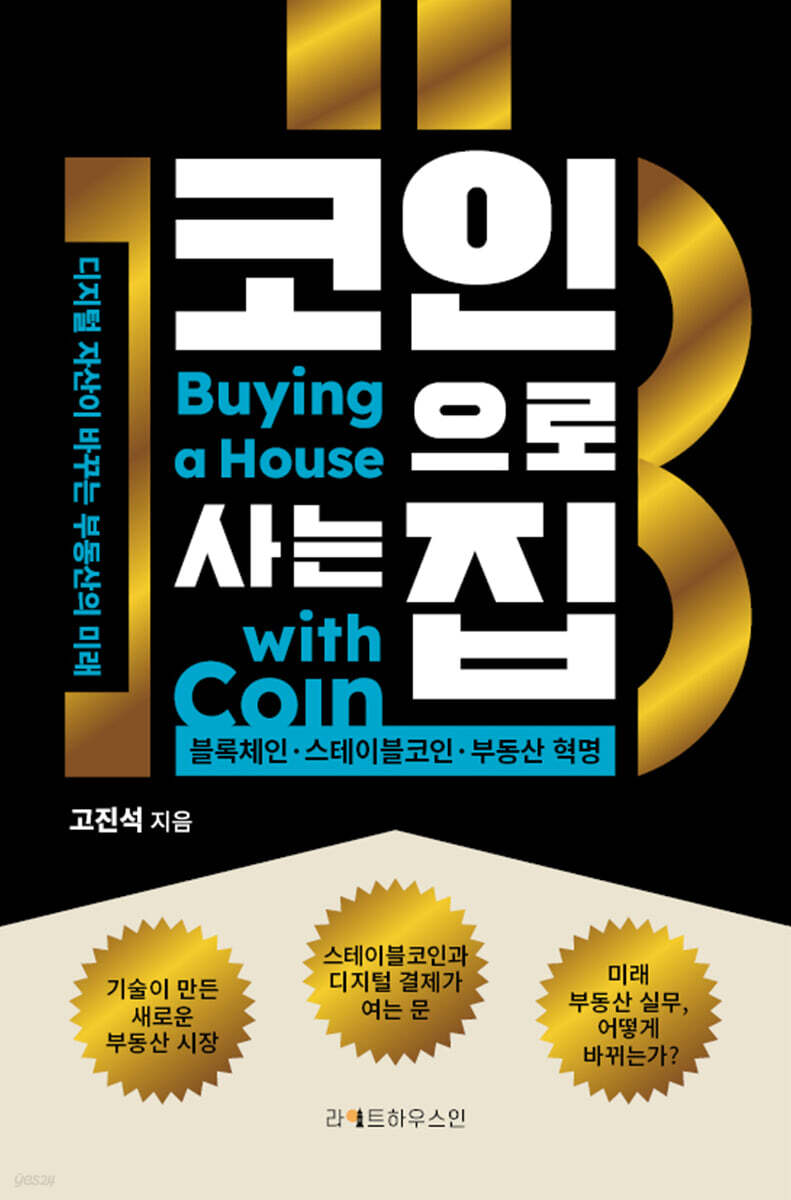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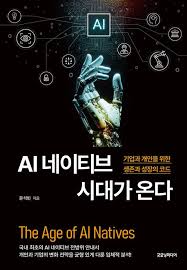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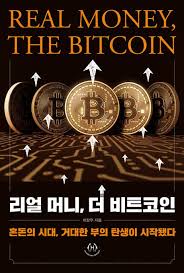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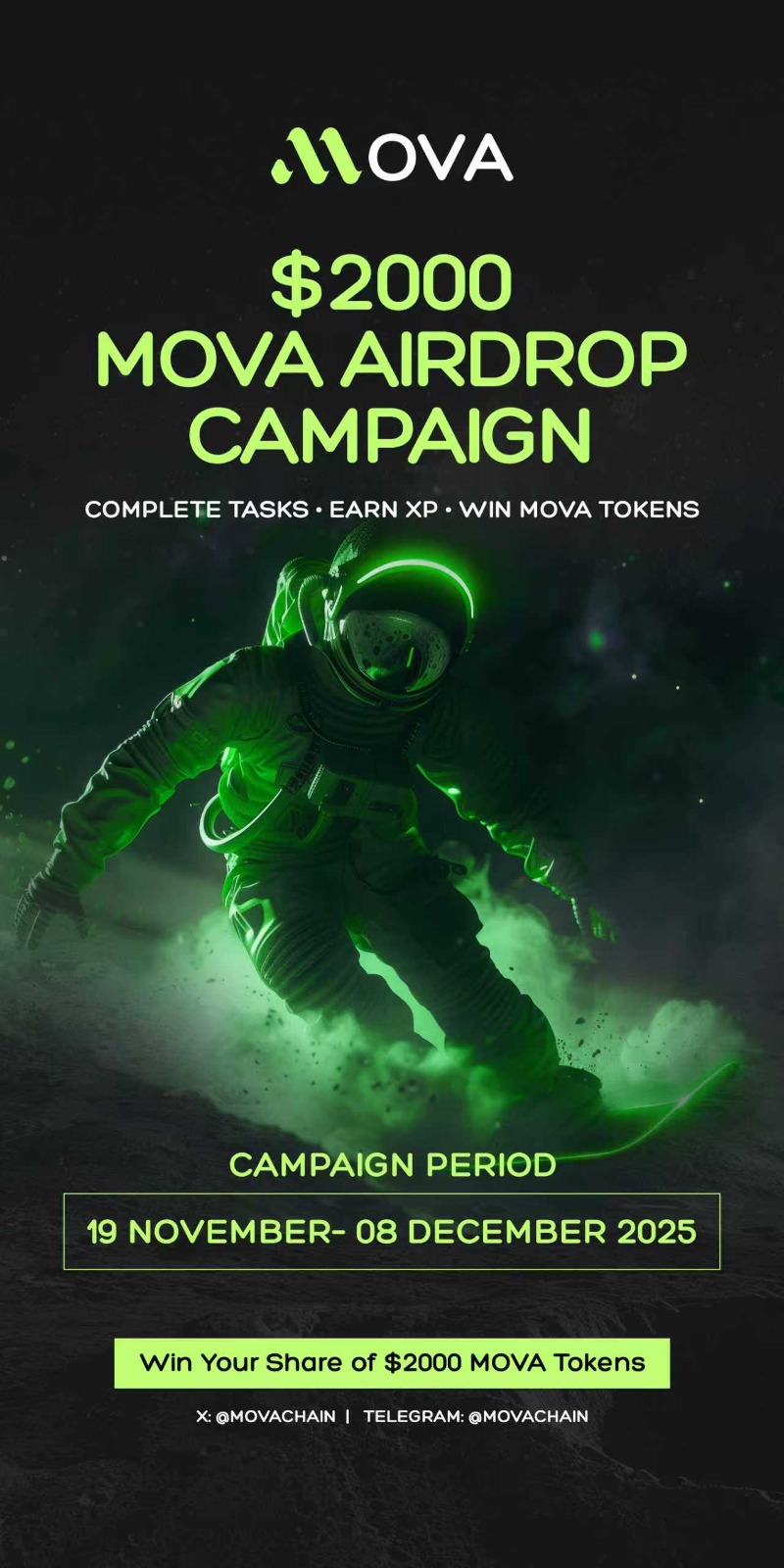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90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hinl1077xr.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89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6rb73ok3c3.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88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us5um50ulw.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8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685fnpghrs.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