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의 부작용과 고금리 환경 속 금융시장 취약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금융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는 한편,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리스크(전체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위험)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규제 체계와 위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고다.
이 차관은 비은행금융기관(은행 외의 투자회사, 보험사, 펀드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 기관은 투자 전략이 다양하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충격이 클 경우 자산가격 급변과 유동성 경색(시장에 자금이 원활히 돌지 않는 상태) 같은 후폭풍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규제 틀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위험을 관리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계 금융 환경은 단기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전환기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 차관의 진단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에 더해,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무역 긴장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부추기고 있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국가 재정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취약성은 국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신흥국의 충격 흡수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국 자격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안정성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 세계 경제 석학,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재편과 디지털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래 금융시장은 기술 진보와 규제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안정성과 신뢰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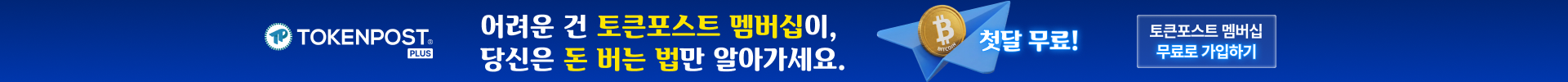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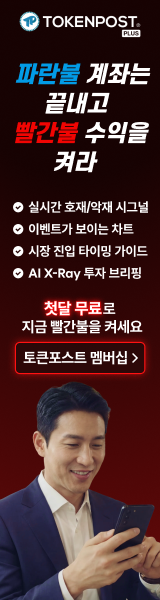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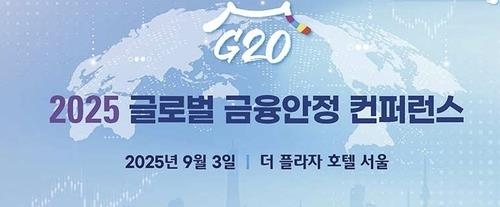


![[사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OEM’ 시대 열었는데, 한국은 언제까지 법안만 만지작거릴 건가](https://f1.tokenpost.kr/2026/01/lraspvmhx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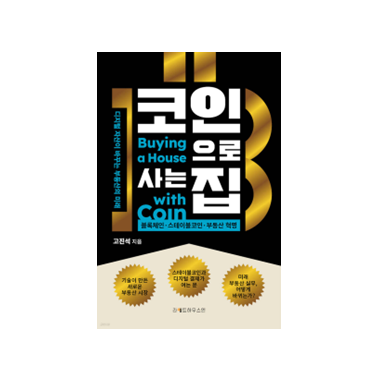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ex810ikkv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