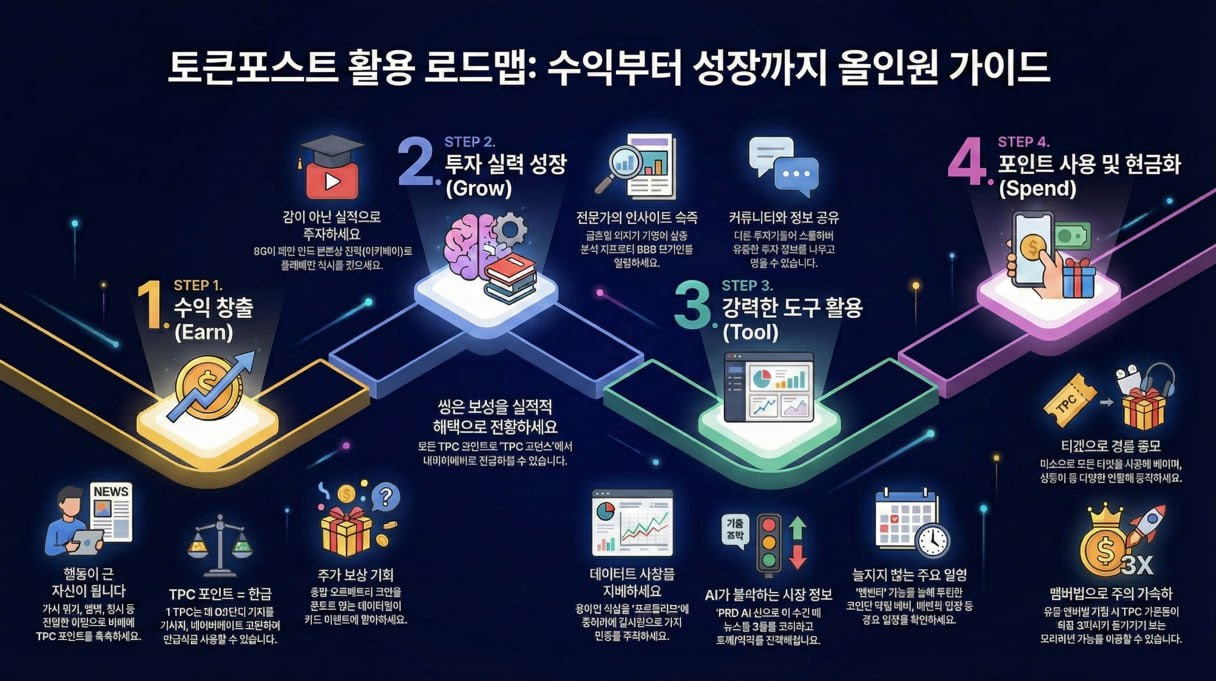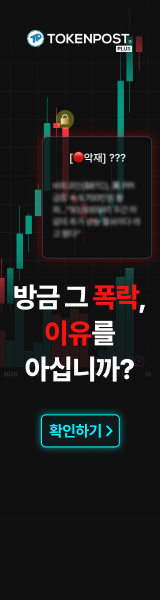학술지의 신뢰성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부실 학술지'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이 이 시스템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약 1,000여개의 의심 저널을 추가로 식별함으로써, 부실 저널의 은밀한 확산 실태를 다시금 드러냈다.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30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됐다. 콜로라도대 대니얼 아쿠냐 교수 연구팀은 학술지 웹사이트의 디자인 구성, 게재 논문 내용, 발간 이력 정보(메타데이터) 등을 AI가 자동 분석하도록 훈련시켰다. 이후 전 세계 오픈 액세스(무료 공개) 저널 1만 5,2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1,400여 개가 부실 의심 저널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350여 개는 인간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 '정상 학술지'로 판명됐고, 나머지 약 1,000개는 사실상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실 학술지란,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다수의 논문을 싣고, 그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게재료를 요구하는 출판 모델을 말한다. 이런 저널은 연구 성과를 손쉽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국제 학계 전반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특히 인용 횟수가 늘어나면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 조기 식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에도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오픈 액세스 학술지 디렉터리(DOAJ)’ 등에서 부실 저널 목록을 유지해왔지만, 해당 작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DOAJ는 2003년부터 ‘동료 평가 실시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널을 평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양산되는 부실 학술지를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AI 기반 분석 플랫폼은 부실 저널 탐지의 속도와 정교함을 크게 높일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아쿠냐 교수는 "기초 과학은 다른 연구 위에 쌓이는 구조여서, 부정확한 논문이 그 기반에 자리 잡으면 전체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저널 확산을 막기 위한 과학계의 감시망 역할을 AI가 맡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라며 인간의 개입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진은 AI 플랫폼을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곧 대학과 출판 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와 학계 윤리를 보호하는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같은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 부실 출판 산업에 대한 억제 효과와 함께 연구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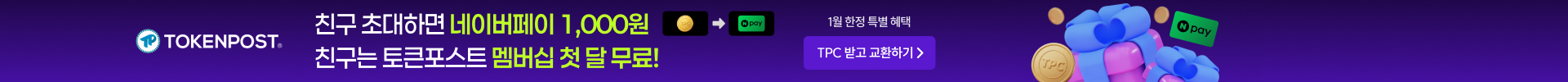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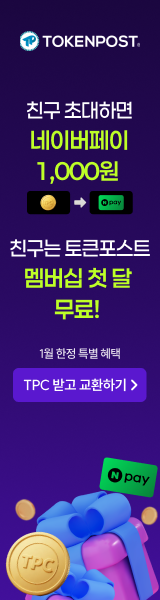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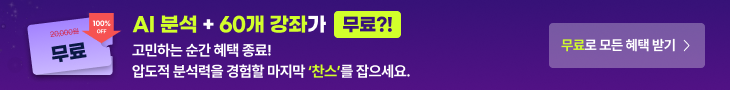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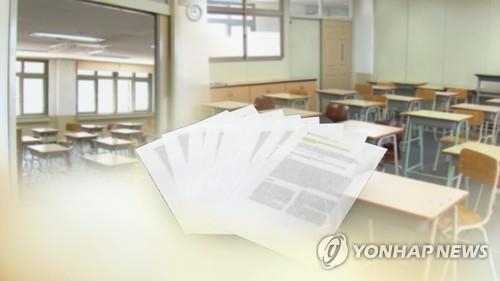


![[KOL 인덱스] 비트코인 CME 갭 해소 이슈 커뮤니티 집중 조명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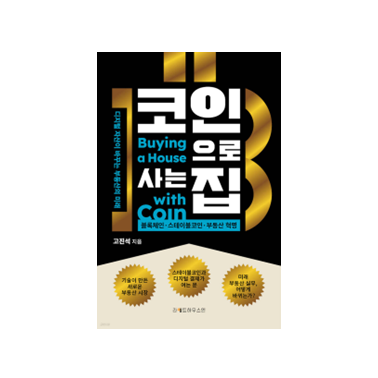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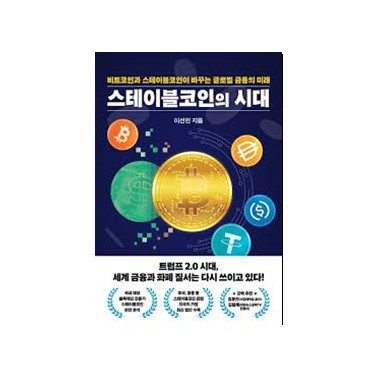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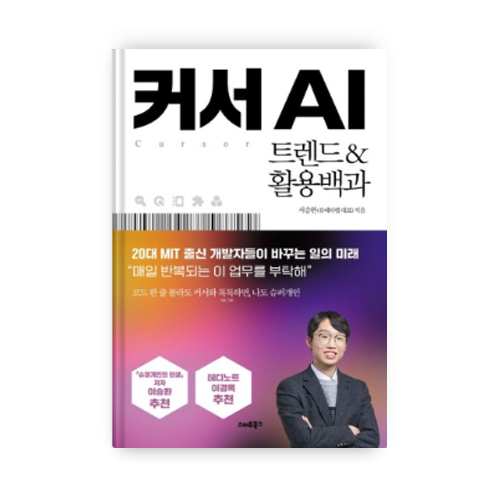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w4ws4u3wna.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dyt9nuea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gxcvpw0z7.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p4u5wsszac.jpg)







![[토큰포스트 칼럼] 소셜미디어를 잠식하는 ‘AI 슬롭(Slop)’과 ‘브레인롯(Brainrot)’… “관심 경제의 어두운 민낯”](https://f1.tokenpost.kr/2026/01/u8314jbskr.jpg)
![[스테이블코인 2026] ①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2000억 달러 시장과 규제의 등장](https://f1.tokenpost.kr/2026/01/pn0eq91q1k.png)
![[시장분석] 금·은 역대 최고가...](https://f1.tokenpost.kr/2026/01/sk1oyjlefu.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