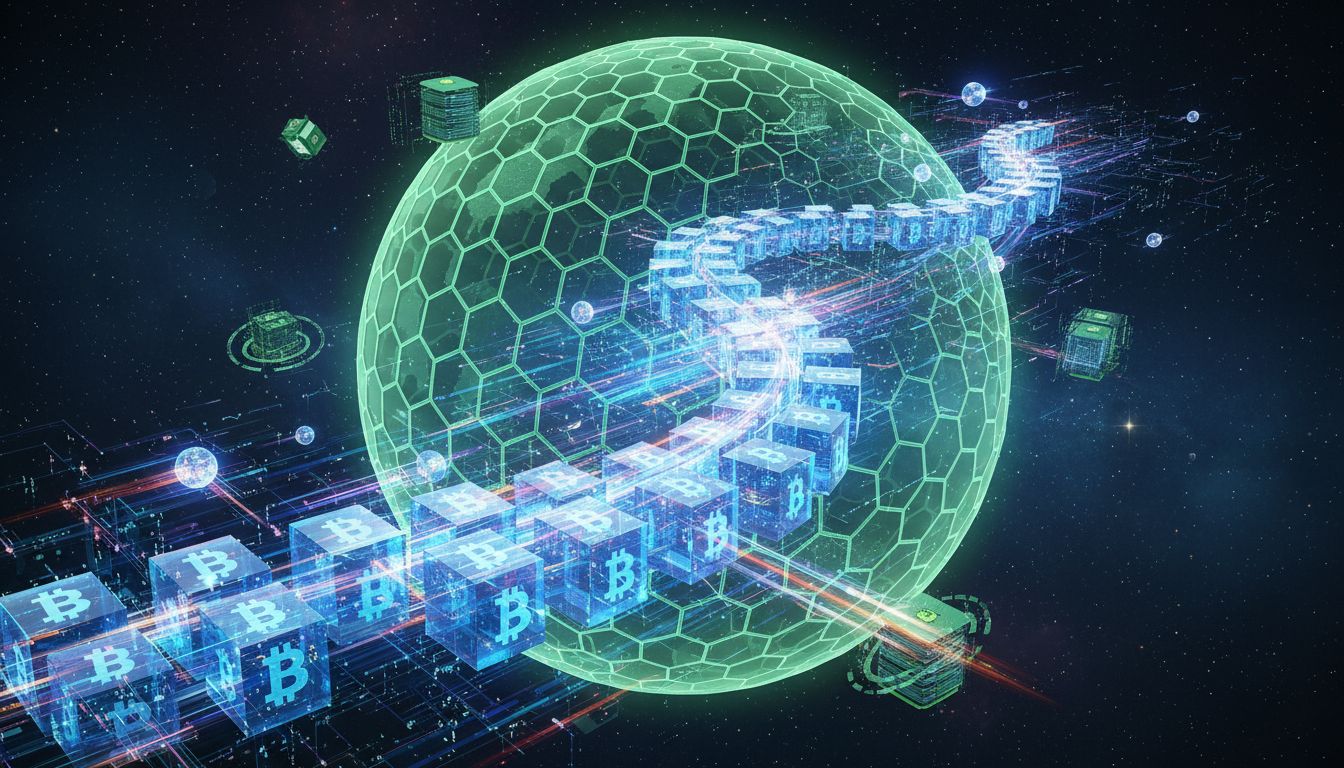오픈AI가 미국 외 지역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인도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시장 선점과 연산 능력 확보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손잡고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를 투자해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미국 내에서 중심적으로 이뤄지던 이 계획은 해외로 무대를 넓히며 점차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인터넷 시장인 만큼, AI 서비스 확장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지 언론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인도 내 1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지역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기가와트는 대규모 전력 단위로, 1GW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즉, 전용 발전소 급의 전력을 요구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오픈AI는 이미 인도에 법인을 등록하고 현지 조직 구성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뉴델리에 첫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오픈AI의 이러한 해외 진출 움직임은 단지 인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첫 해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개시해 아부다비에 5GW 규모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7월에는 유럽 노르웨이에서도 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기후 요건, 에너지 자원, 규제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각국에 맞춤형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행보와도 맞물린다. 아마존은 같은 날 뉴질랜드에 신규 리전(지역 서버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로써 고객은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 ‘주권형(cloud sovereign)’ 설계를 통해 AI를 포함한 고급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은 호주, 영국 등에도 유사한 데이터센터 투자를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SK와 함께 울산에 해당 시설을 짓고 있다.
이 같은 대형 기술기업들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경쟁은 단순히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각국 내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주요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걸쳐 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간 기술 주권 및 에너지 정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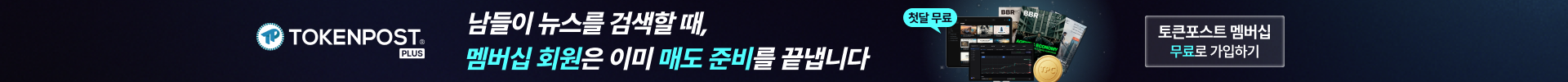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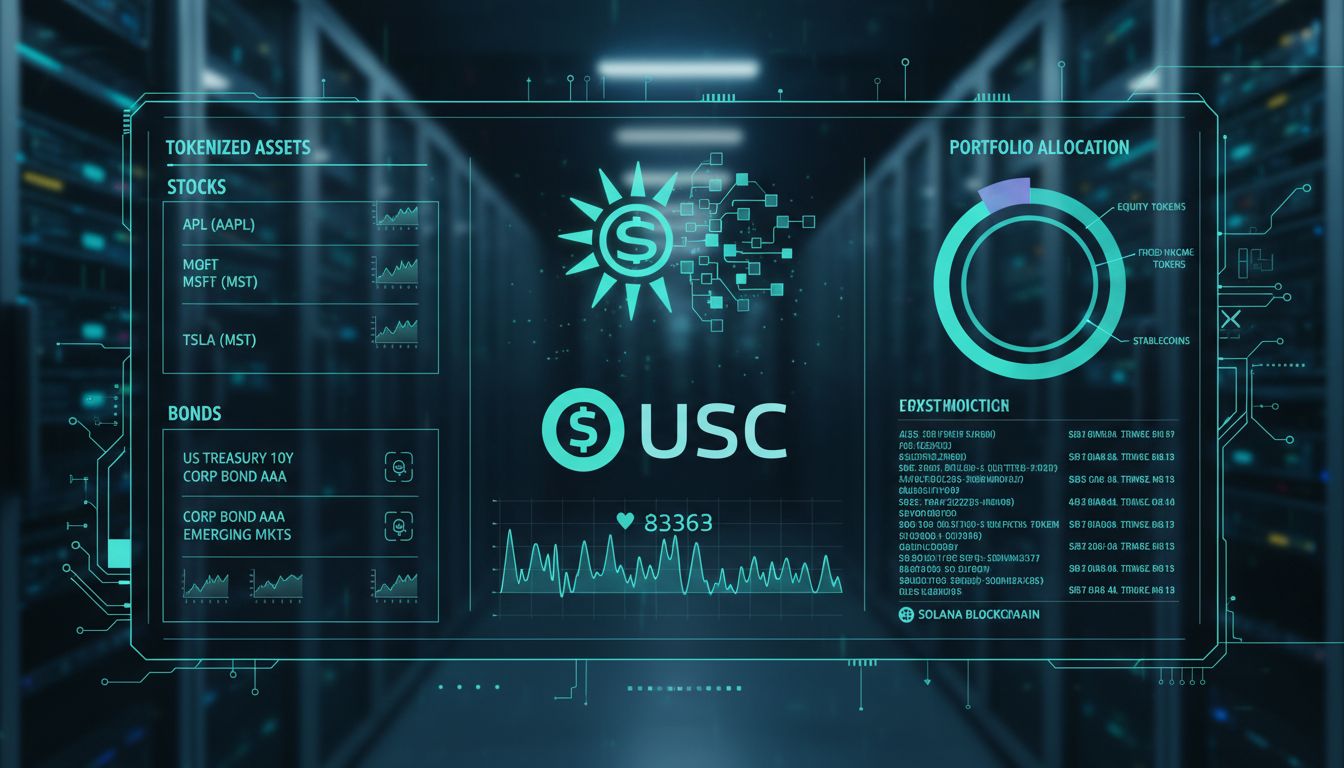

![[토큰분석] “상장만 하면 –80%”… 시장 탓 말고 ‘출구로 설계된 상장’부터 바꿔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6/01/v8tqorms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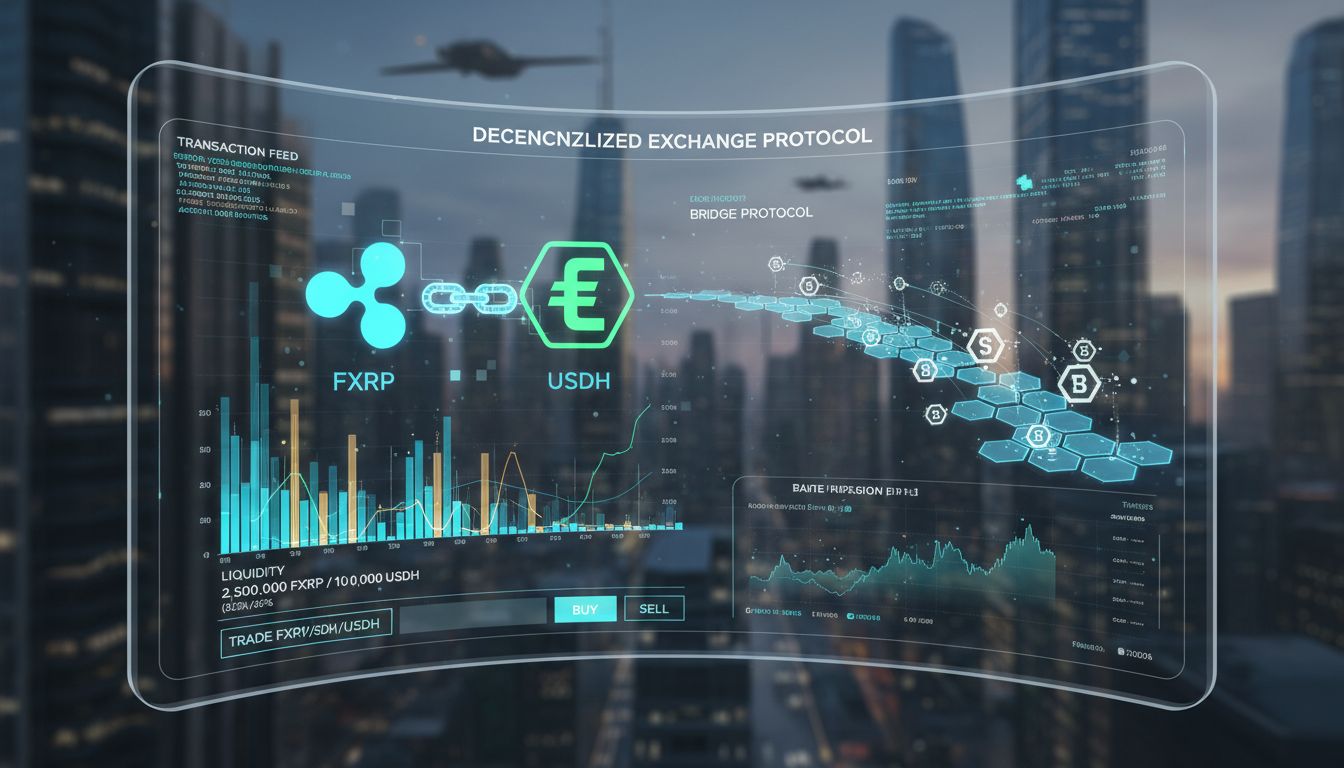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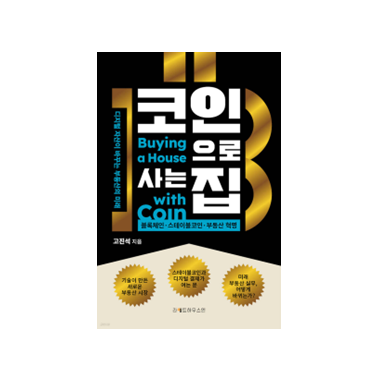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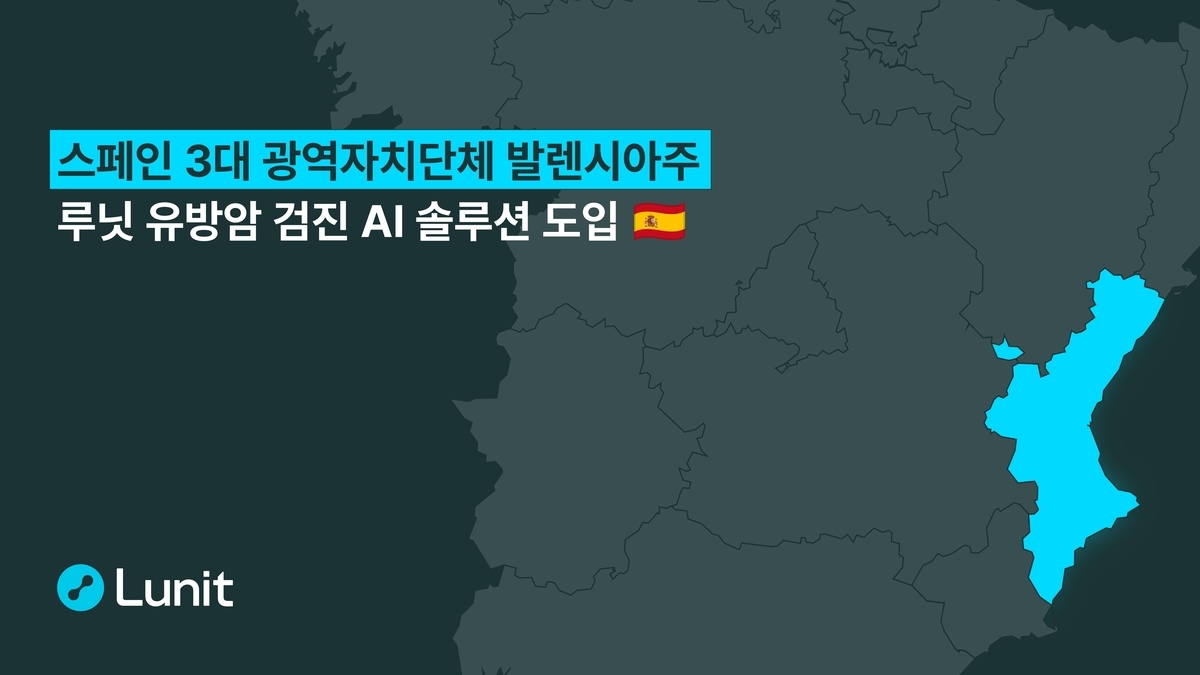



![[국제금융 브리핑] 연준 금리 동결에도 달러 강세...파월 의장 '추가 인하' 신중론](https://f1.tokenpost.kr/2026/01/aj2ndkuac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