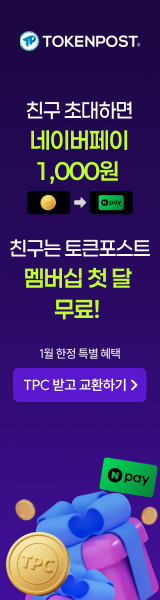한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 규제 혁신, 대규모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AI 투자 여건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로, 구조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정책 로드맵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민관의 투자 불균형과 규제 환경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발표에서 “미국과 중국,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국은 AI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투자 규모와 속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영리 AI 개발사 오픈AI는 지난해에만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을 72만 장 가동했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겨우 1만3천 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간 참여 확대와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풍부한 자본과 완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같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전문가의 진단도 이와 유사했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란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세계 벤처 투자 중 AI 분야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으며, 미국 내 AI 투자액의 76%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 지역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는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만 놓고 봐도 뉴욕의 3.5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위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정부 로드맵만으로는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활발한 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손보고, 인프라와 기술 개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AI를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닌 산업 전반의 성장 촉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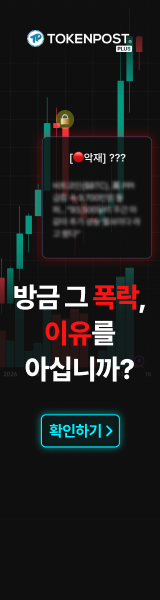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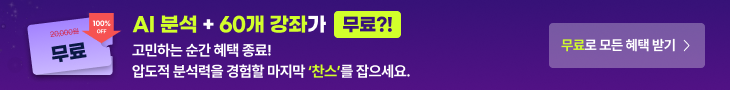









 0
0




![[토큰분석]](https://f1.tokenpost.kr/2026/01/ff0lfi3pr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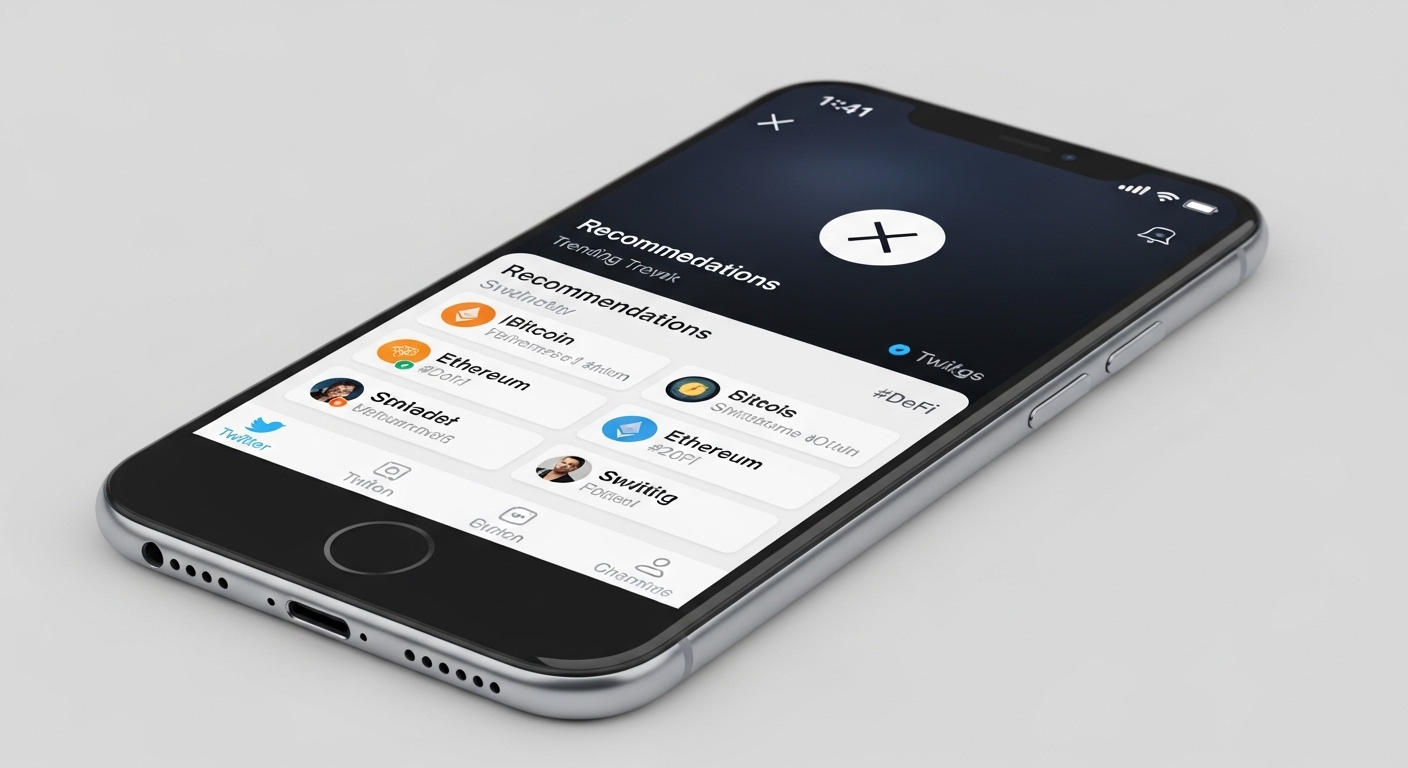
![[KOL 인덱스] 비트코인 CME 갭 해소 이슈 커뮤니티 집중 조명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코인 TOP 10 주간동향] 나폴리·엑시인피니티 강세... 매수 체결강도 500% 종목 다수 출현](https://f1.tokenpost.kr/2026/01/35qzlv1uj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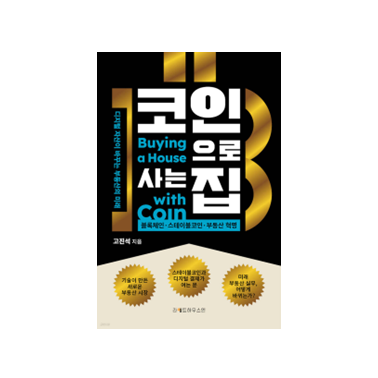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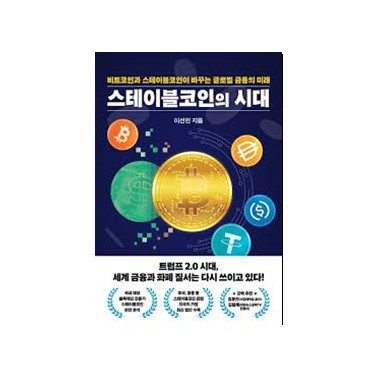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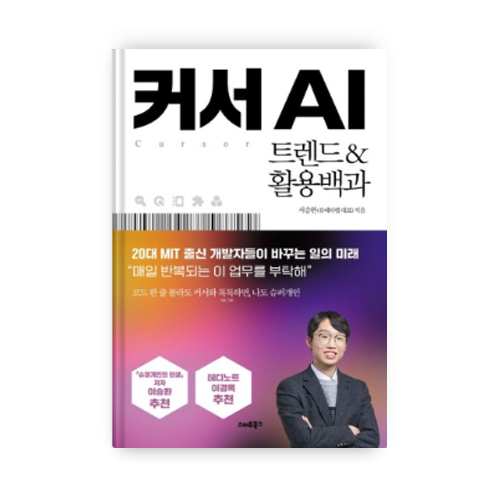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w4ws4u3wna.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dyt9nuea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gxcvpw0z7.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p4u5wssza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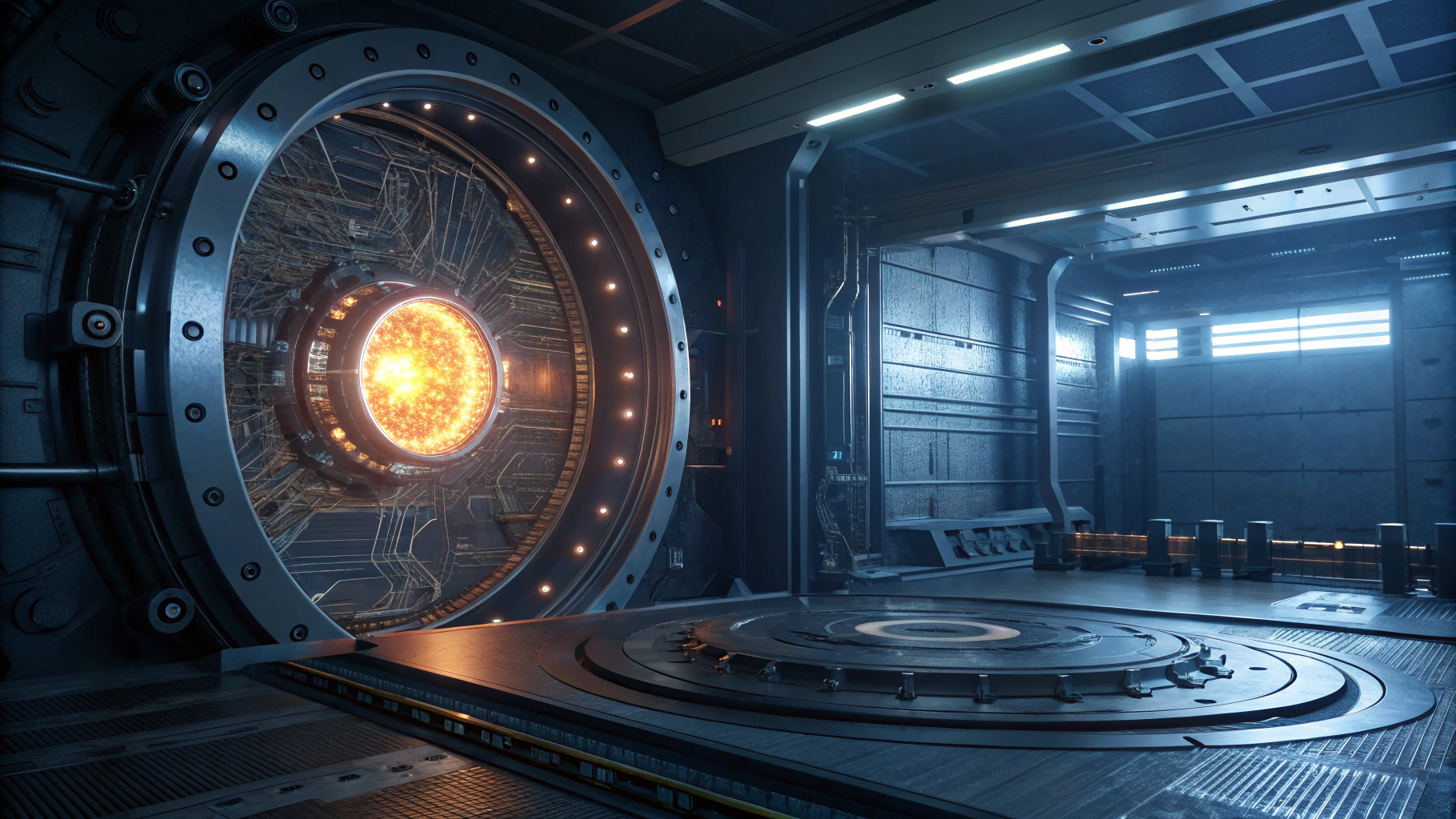





![[원화 스테이블코인] ⑤ 돈의 판이 바뀔 때,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https://f1.tokenpost.kr/2026/01/dc55o5y0io.png)
![[부의 재편, 언브로커드 ②] RWA의 진짜 목표: 월스트리트를 쪼개서 블록체인에 올리다](https://f1.tokenpost.kr/2026/01/oj0i3sbae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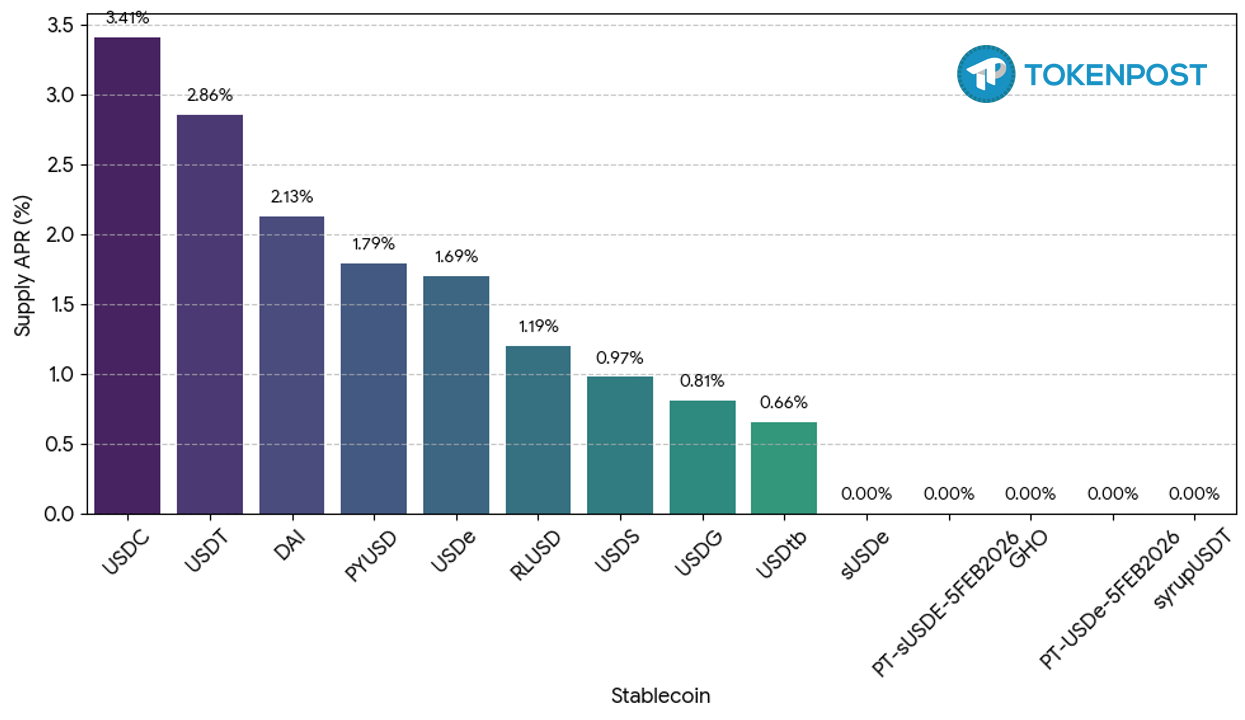
![[사설] 디지털 자산의 무대에 오른 월가, 문제는 배제가 아니라 주도권이다](https://f1.tokenpost.kr/2026/01/5ach5p5vqc.png)
![[사설] 스테이블코인의 검열 역설, 그리고 온체인 금융이 나아갈 길](https://f1.tokenpost.kr/2026/01/8ztauus7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