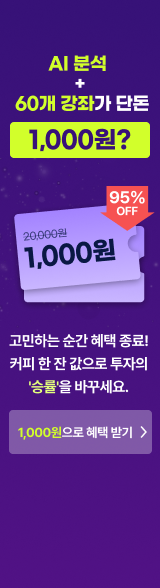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이 각기 달라지면서, 해당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 진입자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제안(MiCA)’, 미국의 ‘GENIUS 법’, 그리고 최근 확정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규제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용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유럽은 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준비금 요건, 발행사 등록 의무,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며 규제의 틀을 잡았다. 미국의 GENIUS 법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반면 홍콩은 이달 초 발표한 규제안에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러운 지역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크립토 산업 속도에 맞춘 규제 정비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간의 차이는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볼 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중개하는 브루크본드의 CEO 크리슈나 수브라마니안(Krishna Subramanyan)은 이와 관련해,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국가의 규제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지역을 벗어난 활용 가능성이나 신뢰성에는 뚜렷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각국의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통합 가능성은 축소시키고 있다는 복합적인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국가 간 규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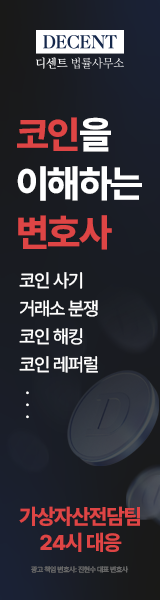








 2
2





![[TP아카데미③]](https://f1.tokenpost.kr/2026/01/1ra8fqy59t.jpg)


![[사설] '익명의 가면' 벗겨지는 암호화폐 시장… 트위터의 몰락이 예고하는 것](https://f1.tokenpost.kr/2026/01/angajhcm25.jpg)
![[TP아카데미⑥] 은행보다 10배 이자를 준다고? '디파이'의 빛과 그림자](https://f1.tokenpost.kr/2026/01/yvvtqkr2l4.jpg)


![[TP아카데미⑦]](https://f1.tokenpost.kr/2026/01/gf349d2unq.jpg)
![[TP아카데미⑤]](https://f1.tokenpost.kr/2026/01/2nun6mm3k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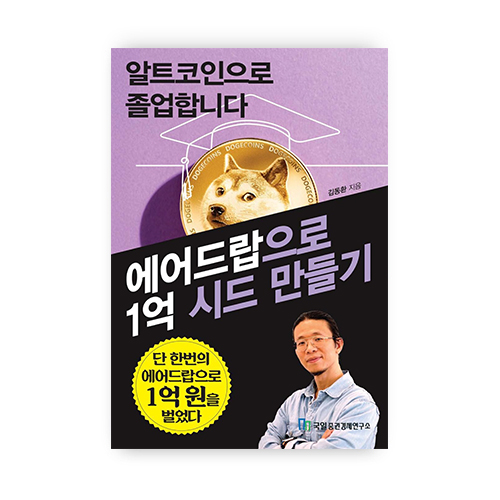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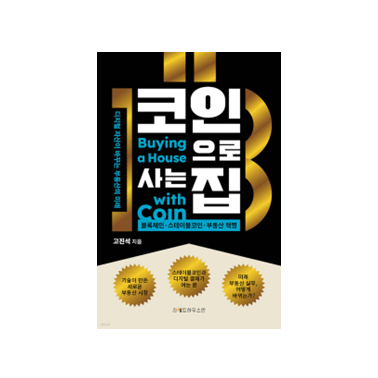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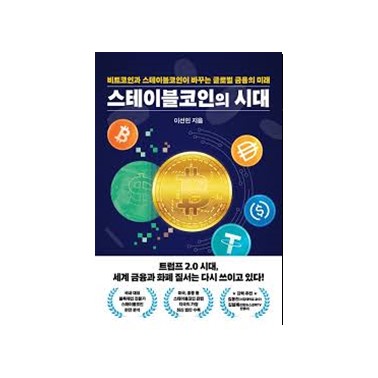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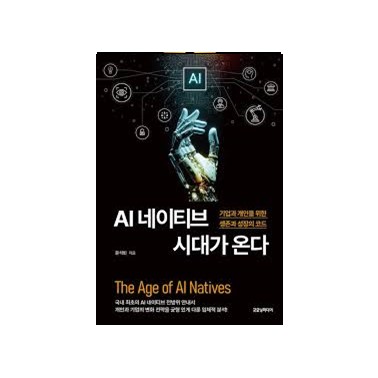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gw1dm61ji8.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rxh0prwmk.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6vamcvu8s9.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b50rzae1cm.jpg)





![[TP아카데미①]](https://f1.tokenpost.kr/2026/01/7l7brpavu5.png)





![[TP아카데미⑪] 차트의 소음을 제거하라… 추세의 나침반 '이동평균선'](https://f1.tokenpost.kr/2026/01/eag4uo6dl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