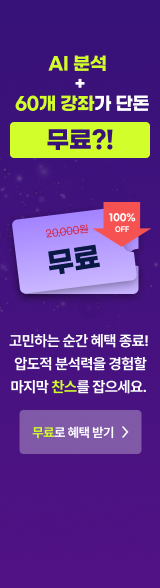인공지능(AI)이 미래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부상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AI 인프라 투자와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제도적 지원이 힘을 더하면서,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거점 조성작업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울산시는 최근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3만6천 제곱미터 부지에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유치했다. 2029년까지 총 7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이 사업은 103메가와트(㎿)급 규모로 설계됐으며, 국가 차원의 관심 속에 산업 중심 도시 울산이 AI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한 계기가 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노리고 있다.
AI 기반 제조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지역도 있다. 경상남도는 제조 분야 전용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국비 및 민간 자본 총 1조 원을 들여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공정 정밀 제어, 예지 정비(장비 고장의 사전 예측) 같은 산업용 AI 솔루션을 개발해 국가 제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범용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주, 대구, 전북 등 정부가 AI 혁신거점으로 지정한 주요 지역들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시뮬레이터 시설을 기반으로 'AI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AX 실증밸리 2단계 사업에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은 역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구현 기반을 시설화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 자체 비전을 내세운 전략도 있다. 인천시는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를 기치로 제조와 물류 분야의 AI 활용을 높이고, 외국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AI 워케이션' 사업 및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진 중이다. 충청북도는 AI 생태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 개편 및 전략 기구 설립에 나서기로 했고, 경기도는 보안이 강화된 행정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올 11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살린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험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AI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소멸 위기를의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예타 면제 제도와 같은 정책적 동력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각 지역이 보유한 주력 산업과 융합된 기술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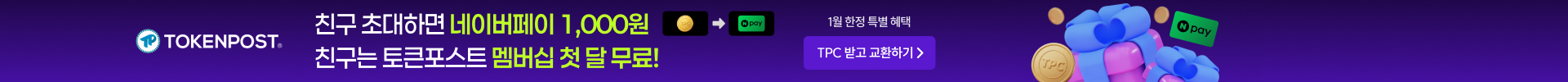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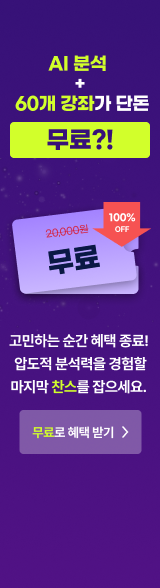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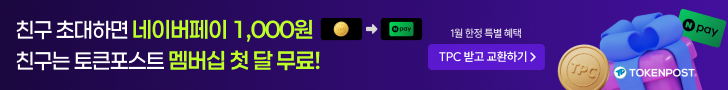









 1
1




![[KOL 인덱스] 비트코인 CME 갭 해소 이슈 커뮤니티 집중 조명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알트 현물 ETF] XRP·SOL 유입 재개, DOGE·LINK 보합](https://f1.tokenpost.kr/2026/01/bwmilgmb9l.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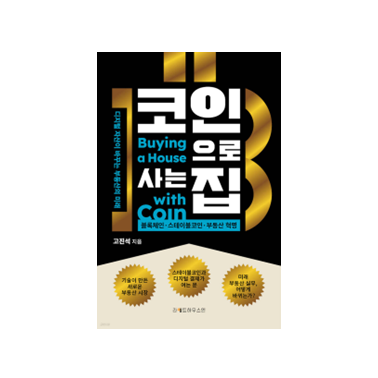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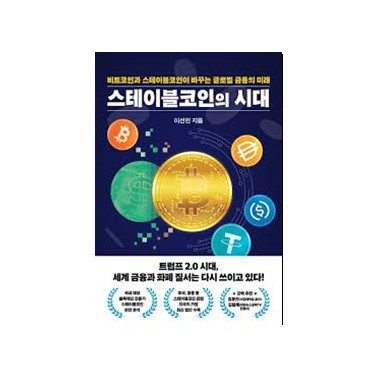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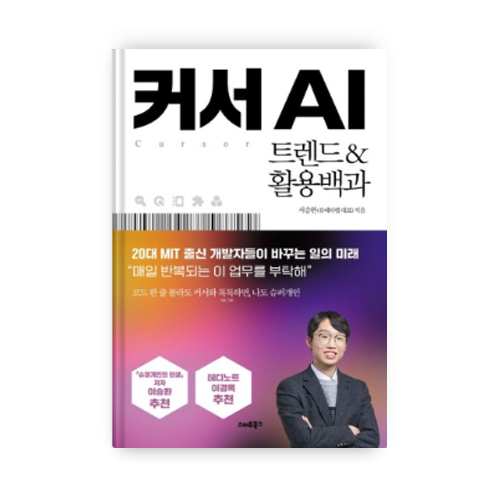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w4ws4u3wna.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dyt9nuea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gxcvpw0z7.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p4u5wssza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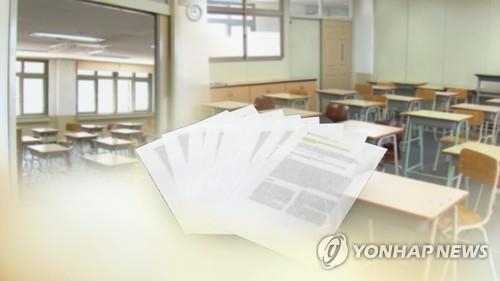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2026] ③ 미래 전망: 트레이딩을 넘어 'AI 커머스' 시대로](https://f1.tokenpost.kr/2026/01/tf22mv896w.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