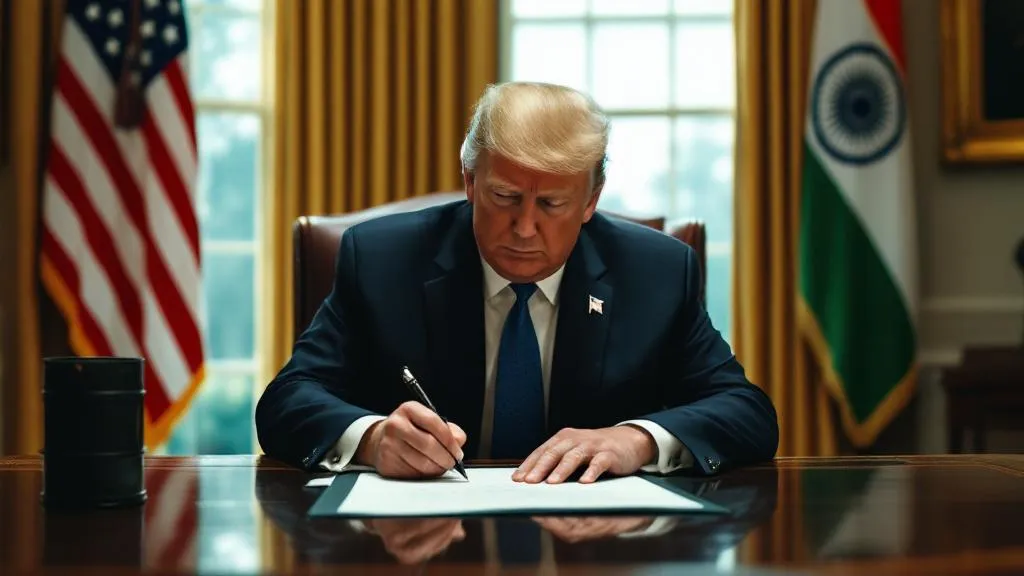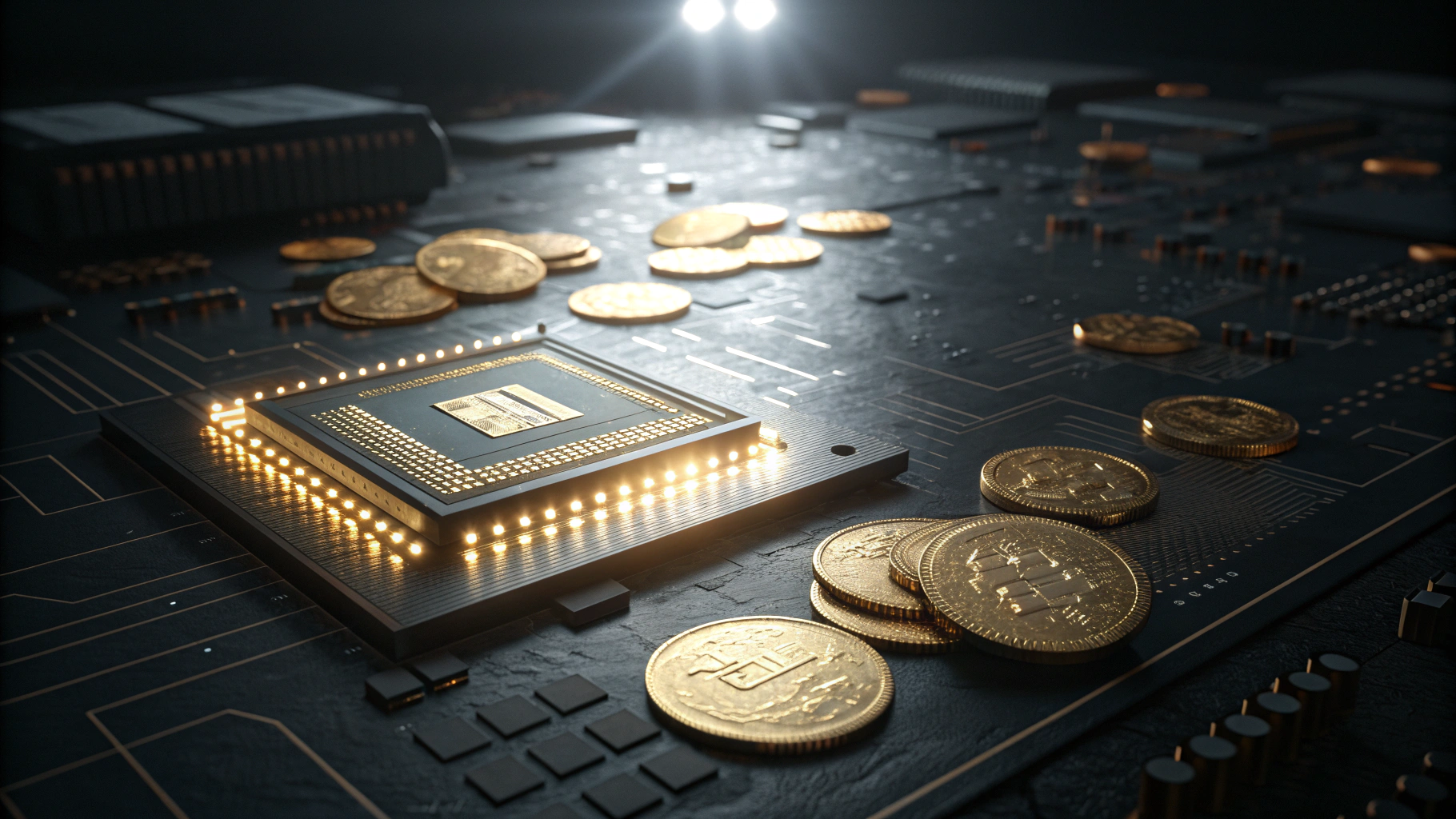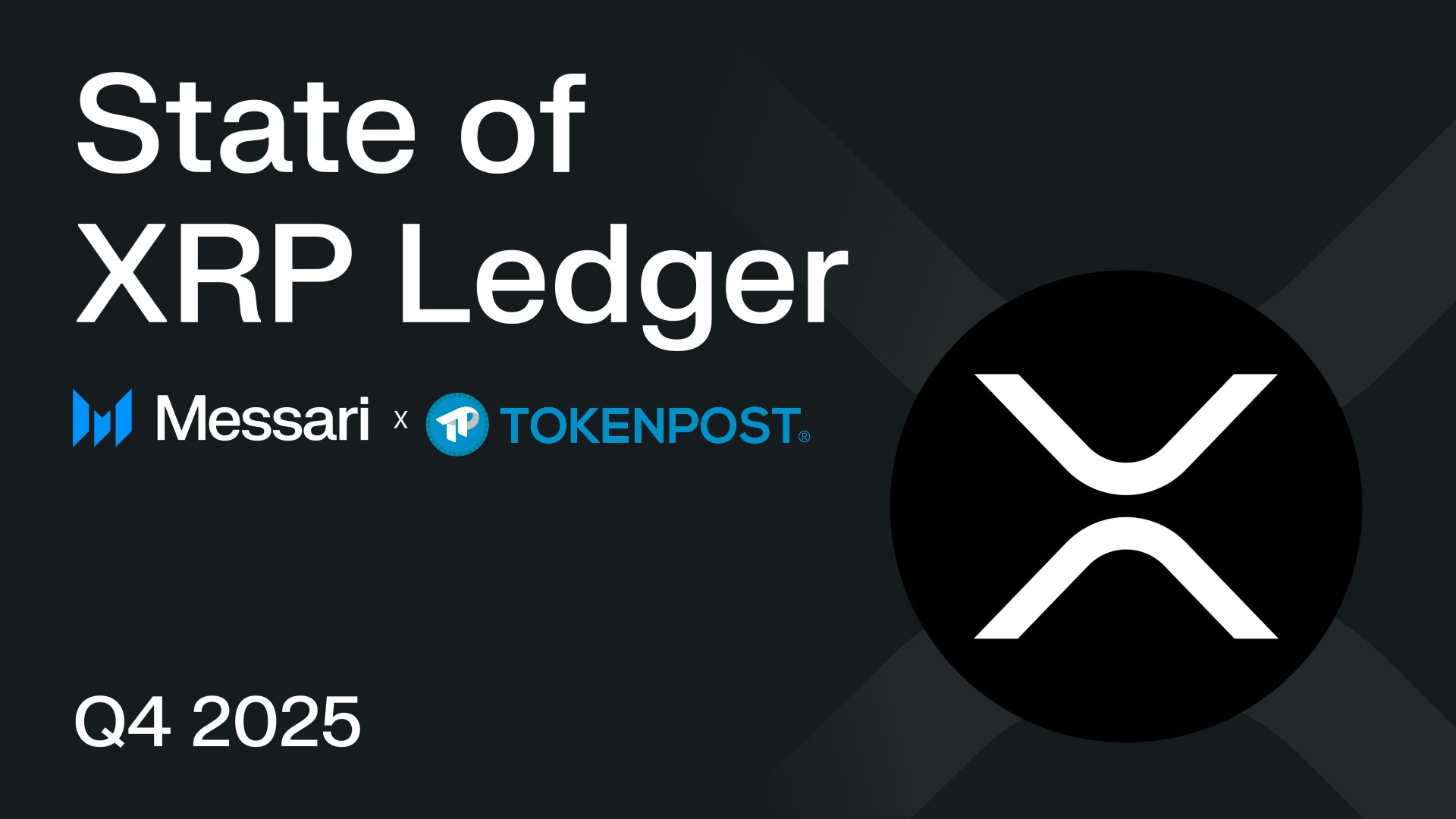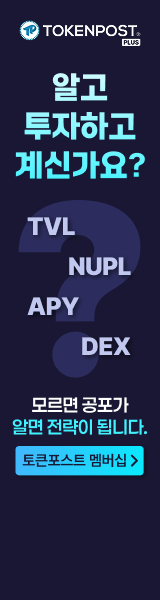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단행한 고율 관세 조치가 시행 6개월을 넘기면서, 예상보다 완만한 경제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려됐던 대규모 충격은 없었지만, 관세로 인한 파장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된 무역 상대국에 평균 10∼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수지 개선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외에서는 인플레이션 급등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경제적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8.3%로,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처럼 가파른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1.2% 성장하며 지난해 연간 성장률(2.5%)에 비해 둔화되긴 했지만,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 실제로 6월 기준 관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배 늘어난 27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적자 역시 602억 달러로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으로 긍정 효과를 평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무역 적자 감소는 관세 도입 직전 기업들이 수입 물품을 선조달해 재고를 늘린 일시적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관세 자체로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의 세수 확보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기업들의 생산기지 회귀(리쇼어링)에 대한 기대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외교협회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관세 정책이 투자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 역시 미국 내 생산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리쇼어링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관세 부담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자체 흡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점차 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망이다. 연말까지 주요 수입품 가격이 3∼4%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관세 정책이 확대되거나 지속될 경우, 소비자 물가와 경기 전반에 보다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제조업 회복이나 무역 개선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관세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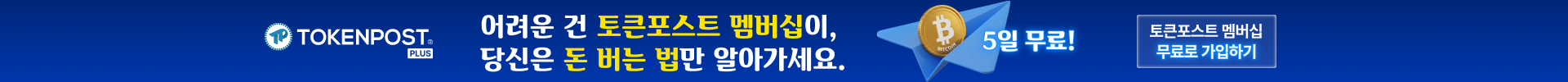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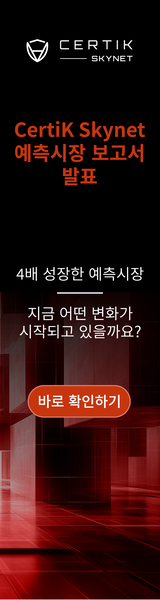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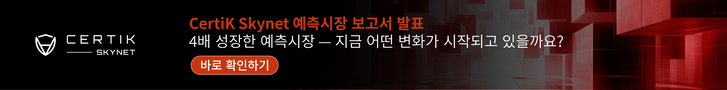









 0
0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etvwueue8.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xki8fbsgk.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eibni8f8j.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wzoyk1y2ly.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