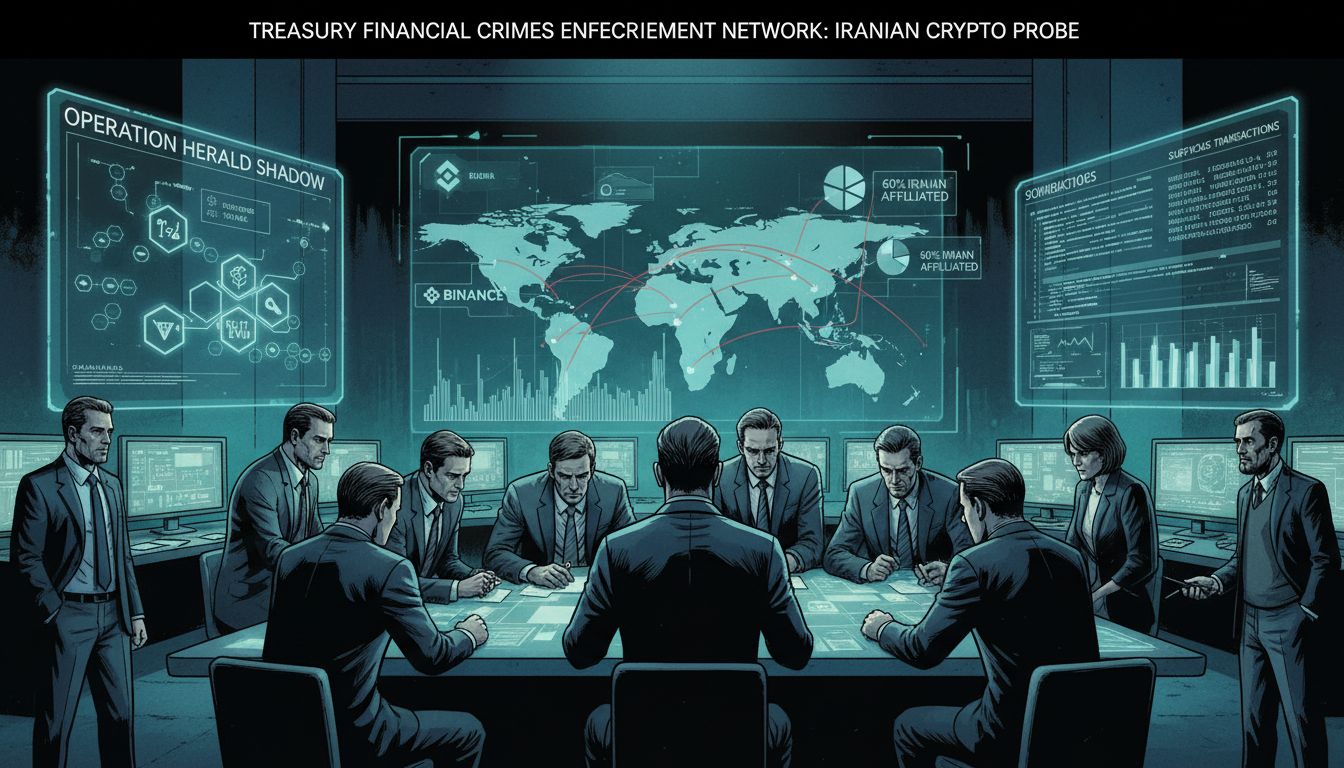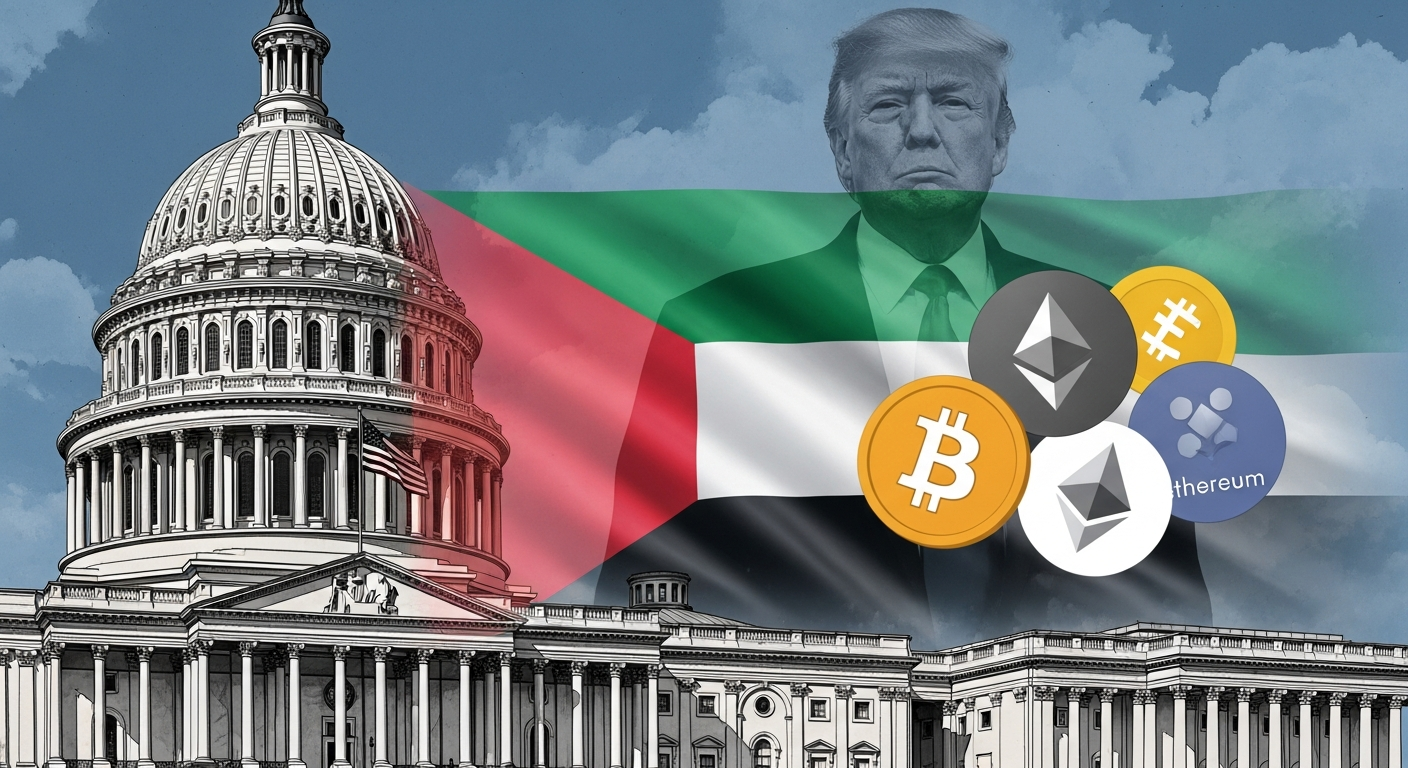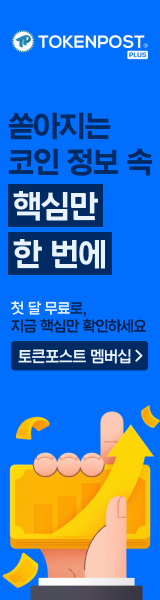기초연구 지원 제도에 유연성이 도입되면서, 내년부터는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과제 유형별 수량이 조정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정 유형의 연구에 신청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대비 5천억 원 늘어난 총 3조 4천억 원의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만 4천600여 개의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 과제 수 증가는 신규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 과제는 전년보다 약 32% 늘어난 9천600개 규모로 확대된다. 이 같은 증액은 이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기초연구 분야의 회복 조치로도 해석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과제 신청 상황에 따라 과제 유형 간 수량 조정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핵심연구 유형에서 연간 지원규모가 다른 1억 원, 2억 원, 3억 원 과제 간에 실제 신청률에 따라 배분 조정을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유형별로 정해진 수량 범위 안에서만 선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수요에 따른 대응력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 복원도 병행했다. 과거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소규모 기초연구 지원이 부활해, 1억 원 미만 전임교원을 위한 기본연구 과제 약 2천 개, 6천만 원 수준의 비전임교원 과제 약 790개도 신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경력과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기회가 보다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확대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일부 핵심연구와 신진연구 과제의 연구 기간이 연장돼,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정부가 기초연구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이러한 유연한 과제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평가 부담을 줄이며,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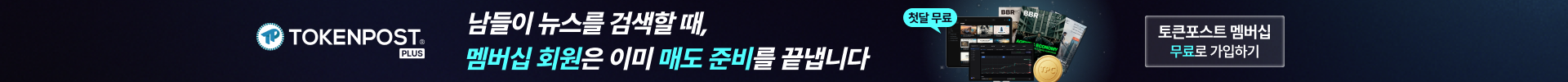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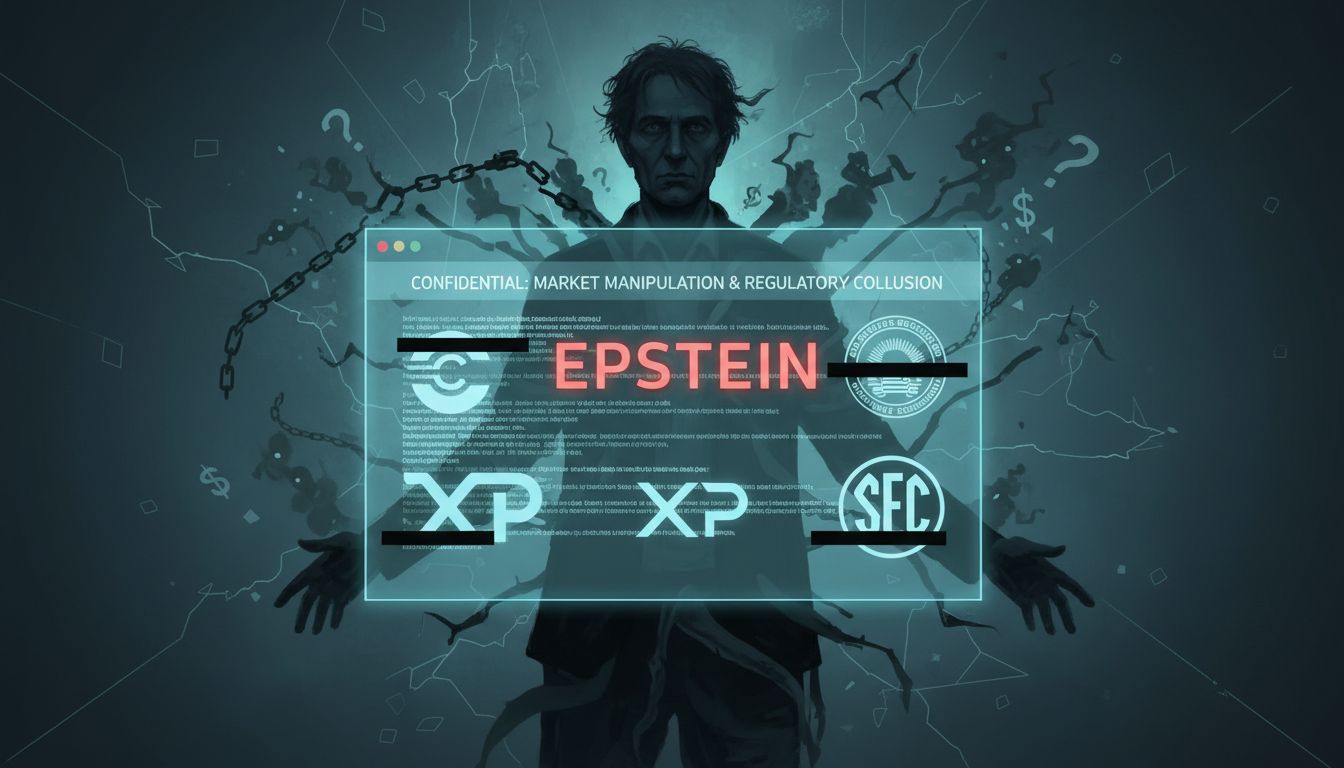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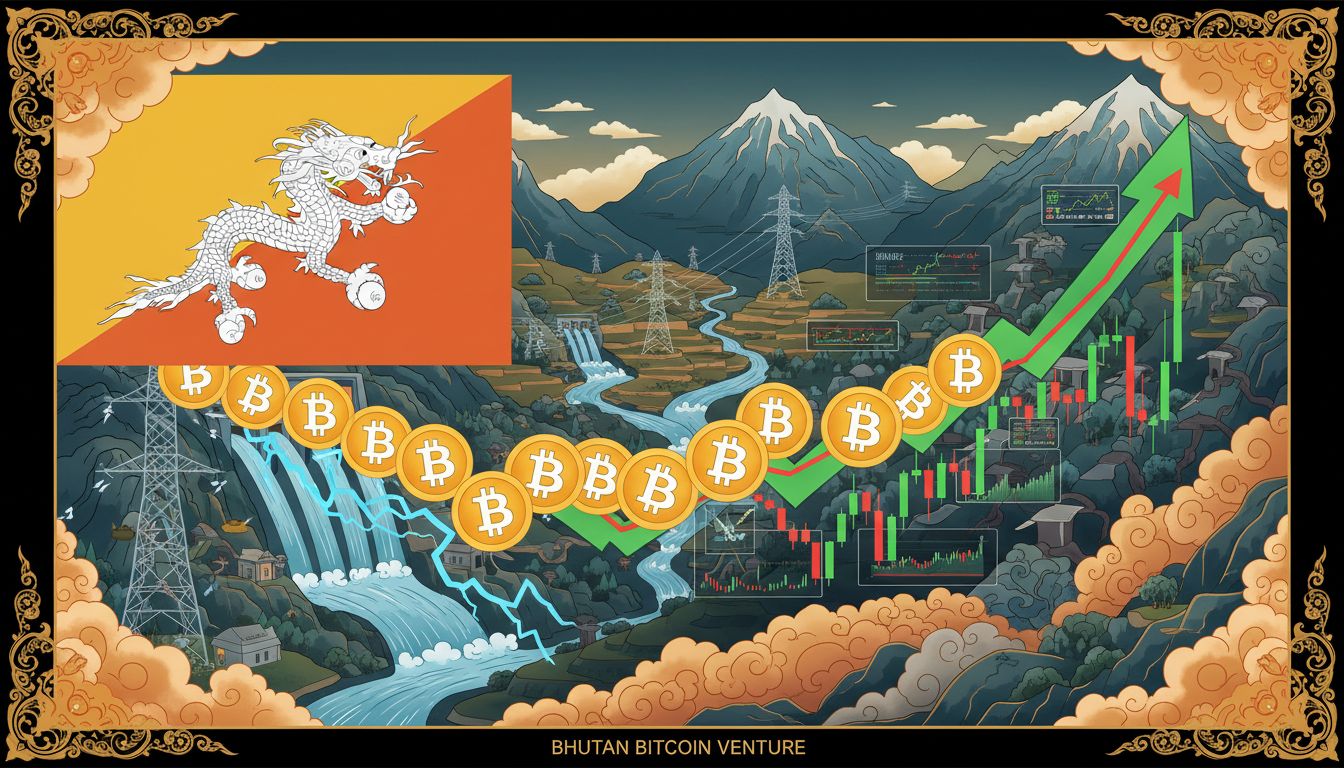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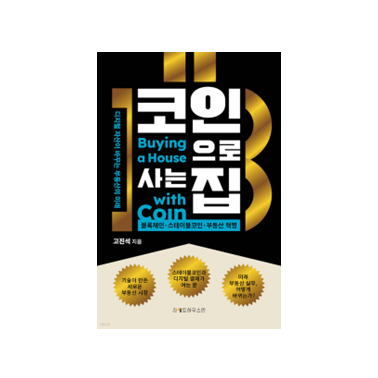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토큰포스트 칼럼] 시장은 흔들리지만, 기관은 배관을 고친다](https://f1.tokenpost.kr/2026/02/vhigbwm5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