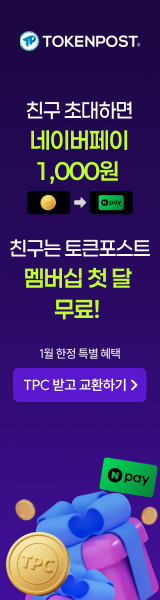10월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승인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심사가 마침내 끝났다.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2021년 철수 후 4년 만에 다시 한국 시장에 돌아왔다. 미국 당국과의 소송이 종결되고, 고팍스의 사업계획이 국내 규제 기준을 충족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한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바이낸스의 복귀는 단지 기업의 재진입이 아니다. 2023년 2월, 제휴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으로 고팍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바이낸스는 67%의 지분을 매입하며 구제 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불확실성과 미국 내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고소했으며, 2023년 11월 바이낸스는 43억 달러 벌금과 형사합의로 사건을 정리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거래소에 실명계좌 사용, 보험 가입, 예치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 그리고 2025년 5월, SEC가 “공익과 정책적 판단”을 이유로 바이낸스에 대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는 혁신을 죽인다”는 선언으로 친(親)암호화폐 기조를 강화했다. 미국의 방향이 바뀌자, FIU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이번 승인은 고팍스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2022년 제네시스 파산으로 묶였던 고파이(GOFi) 피해자 보상이 본격 재개됐다. 약 7천만 달러가 지급됐고, 추가 보상도 회수 자산으로 진행 중이다. 바이낸스는 글로벌 유동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은행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독주하던 업비트(거래량 70%)와 빗썸(20%)의 양강 구도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바이낸스가 가진 400여 개 상장 종목, 0.01%대 수수료, 2억9천만 명 이용자 기반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동시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보험을 통해 손실을 대비하도록 규정한다. 이제 바이낸스는 한국의 법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글로벌 수준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 준수와 시장 혁신, 두 가지 시계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같은 시기, 뉴욕에서는 ‘Aptos Experience 2025’가 열렸다. “Real-World Apto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a16z, 블랙록, 서클 등 세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털이 대거 참석했다. 기관용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차세대 거래 인프라가 논의됐고, 프랭클린템플턴과 블랙록은 Aptos 기반 토큰화 펀드를 선보였다. Aptos 네트워크의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행사 직후 85%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블록체인을 ‘기반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뉴욕 현장을 단독 취재 중인 토큰포스트 취재진이 느낀 건 ‘속도의 차이’였다. 한국의 규제가 신중함을 미덕으로 삼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실행과 확장을 통해 현실을 바꾸고 있었다. a16z 파트너는 “우리는 이미 펀드 자산의 일부를 온체인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고, 블랙록 임원은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의 기본 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의 명분 아래 멈춰설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기반으로 속도를 낼 것인가. 투자자 보호는 필수지만, 과도한 지연은 혁신을 해외로 내몬다. 바이낸스의 귀환은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제도권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가 약속한 “한국의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바이낸스의 복귀와 뉴욕의 속도는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규제와 혁신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두 개의 시계 앞에 서 있다. 하나는 규제의 시계, 다른 하나는 혁신의 시계다. 둘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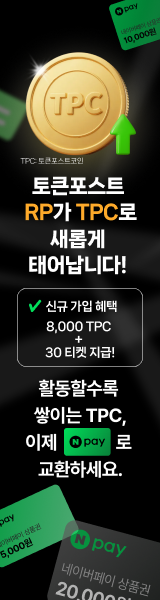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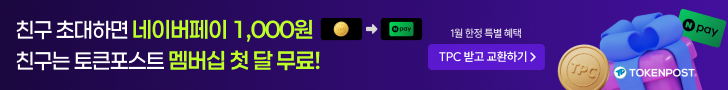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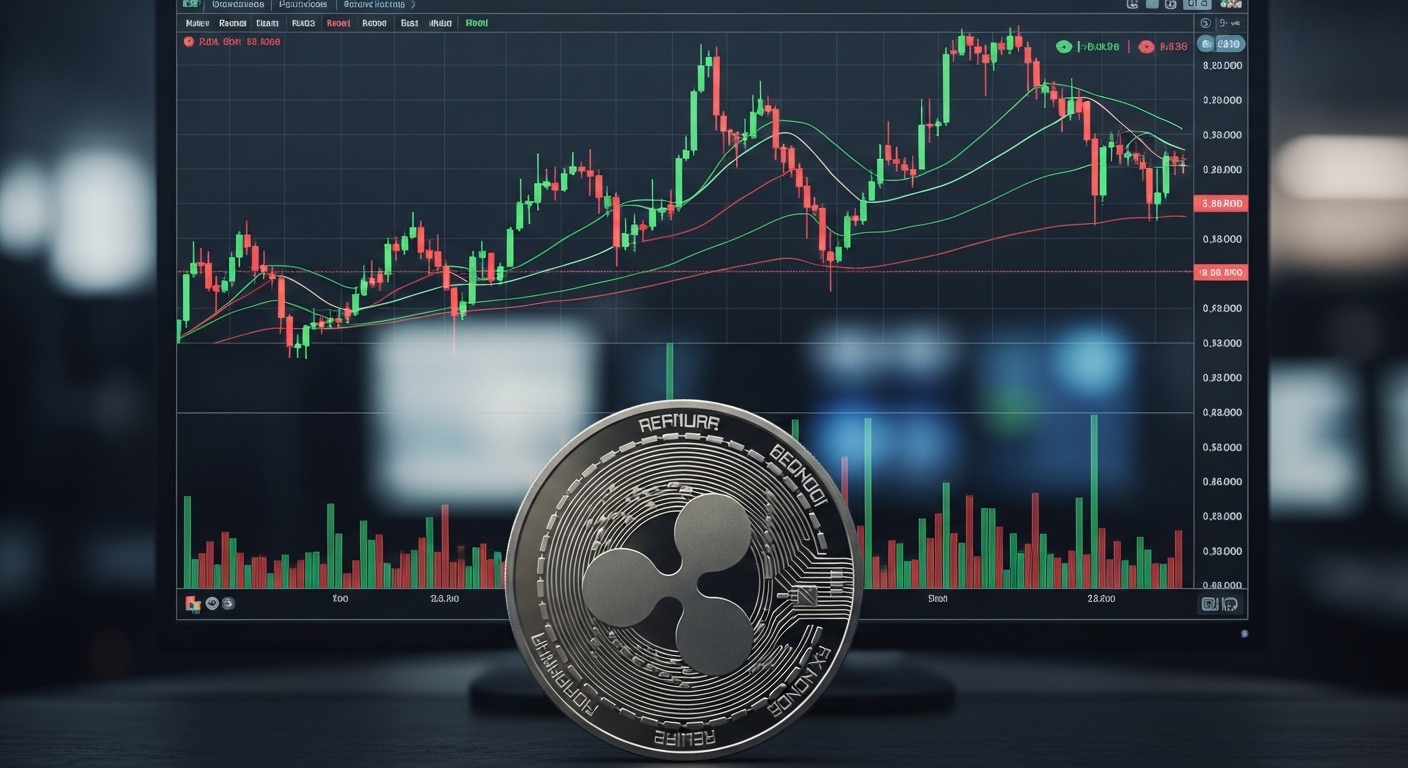
![[모닝 뉴스브리핑] 암호화폐 ETF 대규모 자금 유출…BTC·ETH 중심으로 이탈 가속 外](https://f1.tokenpost.kr/2026/01/hrwelzoojp.jpg)



![[토큰분석]](https://f1.tokenpost.kr/2026/01/ff0lfi3pr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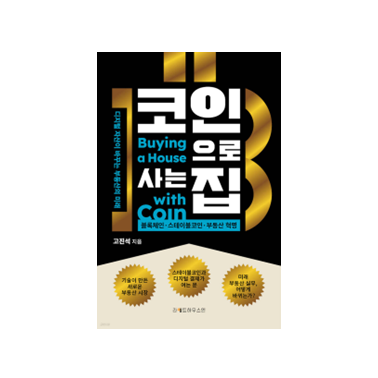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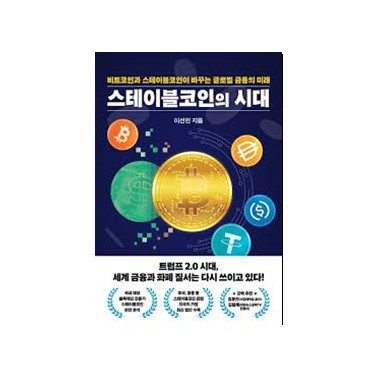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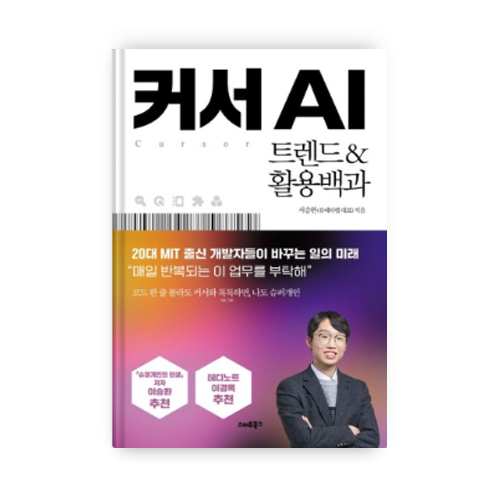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dyt9nuea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gxcvpw0z7.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p4u5wssza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1lhf5bppnp.jpg)
![[사설] 청산은 없지만 자금은 빠져나간다 — 암호화폐 시장의 ‘한국형 위험’](https://f1.tokenpost.kr/2025/10/pdzeup0ljj.png)
![[사설] 중앙은행 없는 암호화폐 시장, 누가 시스템을 지킬 것인가](https://f1.tokenpost.kr/2025/10/wtjwkp9fsm.jpg)
![[사설] 블랙스완이 덮친 코인 시장… 레버리지의 탐욕이 초래한 자멸](https://f1.tokenpost.kr/2025/10/v6fy42ovpq.jpg)
![[사설] 스테이블코인 전쟁, 달러는 진화하고 위안은 갇혔다](https://f1.tokenpost.kr/2025/10/p2mi5t1fvt.jpg)
![[사설] 리테일은 잠들었고, 자본은 깨어났다](https://f1.tokenpost.kr/2025/10/xjndtw2dy2.jpg)
![[사설] 비트코인, 개인의 실험에서 제도의 자산으로](https://f1.tokenpost.kr/2025/10/5xdvdgqdqv.jpg)
![[사설] Token2049 싱가포르 – 한국이 배워야 할 글로벌 무대](https://f1.tokenpost.kr/2025/10/9yc1y0zpzt.png)
![[사설] 세일러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혁신인가 희석인가](https://f1.tokenpost.kr/2025/10/mduhyy1nda.webp)
![[사설] KBW 2025 총평 – 세계가 모인 서울, 법제화로 모멘텀을 지켜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5/09/n8t8kxz4dz.jpg)

![[사설] 레버리지로 지은 집, 결국 무너진다](https://f1.tokenpost.kr/2025/09/kwbz2j234e.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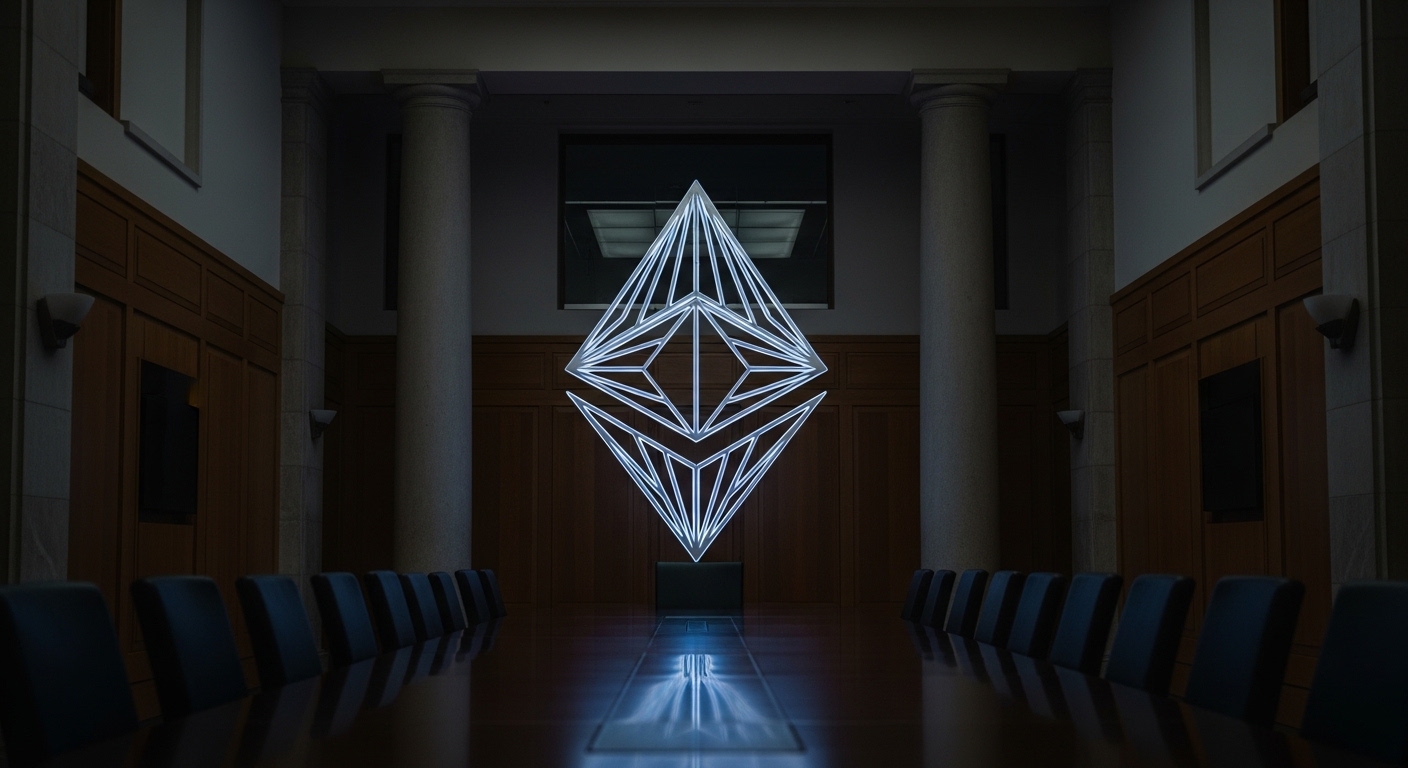
![[원화 스테이블코인] ⑤ 돈의 판이 바뀔 때,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https://f1.tokenpost.kr/2026/01/dc55o5y0io.png)

![[코인 TOP 10 주간동향] 나폴리·엑시인피니티 강세... 매수 체결강도 500% 종목 다수 출현](https://f1.tokenpost.kr/2026/01/35qzlv1uj7.jpg)